중견건설사 잇단 추락…'시련의 계절'
지난 8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73위 월드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11일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마저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채무상환 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동일토건(49위)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수원에 본사를 둔 대림건설(194위)은 최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처럼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위기에 빠진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긴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 그나마 버팀목이 돼준 정부 발주 공사마저 지난해부터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공공부문의 총 수주액은 38조2천368억원으로 2009년보다 34.6%나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 발주가 끝나며 공공부문의 일감이 많이 줄었다"며 "올해도 공공수주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부문의 침체는 더욱 심각해 지난 1월 아파트 분양은 고작 1천333가구로, 지난해의 8%선에 그쳤다.
이처럼 시장이 극도로 침체한 가운데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은 중견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당시 대주단 협약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해온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건실한 건설사는 지원·육성하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퇴출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운명은 사실상 '바람 앞의 등불'이다.
월드건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채권단에 추가 신규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해왔지만, 부실 우려를 이유로 단칼에 거절당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로 내몰렸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으며 간신히 워크아웃은 면했지만, 그 후 실적이 계속 나빠져 모회사인 효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수혈했음에도 결국 스스로 회생하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해왔던 '건설사 연쇄부도'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한 일반종합건설회사는 총 306개사로 2009년의 241개사보다 26.9% 증가했다.
올 1월 한 달 사이에만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전국에서 모두 10곳이다.
한 중견건설사의 대표는 "대형사와는 달리 아파트 분양이 한 곳만 부진해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중견사들로서는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업체들 모임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만 남자'라는 비장한 격려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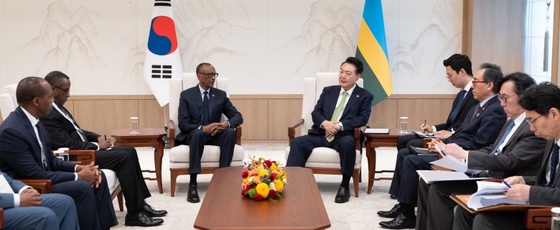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