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문을 연 재단법인 한·중·일 민·상법 통일연구소의 이영준 소장(69·법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리는 3개국의 민·상법 통일에 대한 첫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소장은 판사와 사법연수원 및 동국대 교수 등을 지내는 틈틈이 민법총칙 물권법 등 법학 교과서를 저술하는 등 평생을 법학 연구에 매진해온 1세대 원로 법조인.
그런 그가 정부나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생소한 한·중·일의 민·상법 연구에 나섰다.
언뜻 너무 거창해서 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는 동북아 3개국의 법체계 통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소장은 "세계 경제는 결국 블록화를 거쳐 세계화되고 한·중·일도 어차피 경제적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중국의 합동법(우리 민법의 채권편에 해당)이나 지난 6월 처음 만들어진 물권법은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한국·일본과 공통점이 있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3개국에서 각기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매매계약서와 약관을 표준화하는 것부터가 법 통일의 시발점"이라며 법 통일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중 간 교역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도 계약서에 중요한 권리의무가 쓰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해결이 안되니 적당히 타협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국의 민·상법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약관에 매도·매수인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규정해 놓아도 분쟁을 막을 수 있고,분쟁이 일어나도 이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이 구상하는 민·상법의 통일 순서는 4단계다.
우선 3개국의 민·상법 공통점을 반영해 계약서 표준화 작업을 한 뒤 민·상법의 기본원칙들을 만들자는 것.여기까지 이뤄지면 정부가 나서서 조약의 형태로 이를 공인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민·상법 실정법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정부는 국가의 이념과 역사문제,여론 등을 의식해야 하고 대기업도 각기 이해관계가 달라 법 통일 초기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며 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단 학자들이 3개국의 법 체계를 비교·연구하고 정부와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1960~70년대 6년간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당시 냉전시대에 동독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코메콘'(경제상호원조회의)으로,서독 등 민주진영은 또 자기들끼리 경제 원조와 협력을 통해 이미 각자의 통일된 거래질서를 구축했다"며 "현재 EU(유럽연합)가 헌법 통일을 시도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미 준비작업은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간다"고 지적했다.
2004년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에서 발족된 '한·중·일 민·상법 통일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이 소장은 "이미 일본과 중국은 10여년전부터 이런 논의를 해왔다"며 "한국이 배제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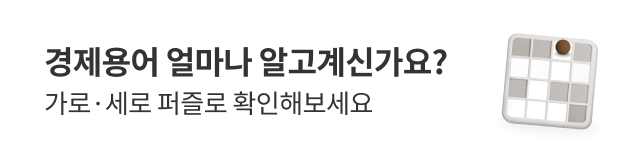


![[속보] 법원장들 "선고 예정 상황…사법부 믿고 결과 봐주시길 부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9320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