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친디아…포옹까진 '먼길' ‥ 후진타오, 中주석으론 10년만에 인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23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한다.
중국 주석의 인도 방문은 1996년의 장쩌민(江澤民) 이후 10년 만이다.
◆구원은 풀리나
중국과 인도가 최근 급속히 밀착하는 모습이다.
1999년 20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인도와 중국의 교역액은 올해 200억달러,2010년에는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두 나라는 경제교류 확대 차원에서 44년간 폐쇄됐던 비단길인 '나투라' 고갯길도 지난 7월 다시 열었다.
지난해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뉴델리에서 싱 총리와 회담을 열어 1962년의 전쟁 이후 계속돼 오던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후 주석 역시 이번 방문기간 중 만모한 싱 총리와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북한 핵실험 사태,유엔 개혁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외무장관 간의 핫라인 개설, 양자투자보호협정(BIPA) 등 12개의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양국이 아직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만 같을 뿐 속내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경협 탄력 받을까
인도와 중국의 인구는 합쳐서 대략 24억명.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하면 사실상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FTA에 적극적인 반면 인도는 소극적이다.
인도는 중국의 값싼 공산품들이 자국의 가정을 점령하는 데 대해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개방하면 가내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국 업체들은 모조리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도측의 시각이다.
인도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중국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인도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앞선 2003년부터 중국과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고서도 아직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결론조차 못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비슷한 이유로 인도는 중국기업의 자국 진출도 피하는 모습이다.
인도는 올해 중국 업체들이 제안한 3건의 초대형 직접투자를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했으며 중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에도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다.
인도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15개사에 그칠 정도다.
여기에 일본이 변수로 작용한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12월 일본을 향한다.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일본과 인도 미국 호주 등 4개국이 주도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일본의 인도를 향한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서진정책에 따른 역풍을 차단하면서 서남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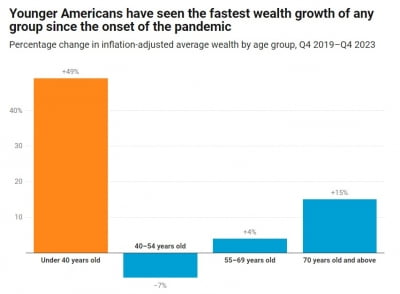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