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39
수정2006.04.02 15:42
독일 법원은 20일 경찰이 유괴된 어린이 행방을 빨리 찾아내 살리려는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고문할 수 있다고 위협만 했더라도이는 유죄라고 선고했다.
함부르크 지법은 이날 볼프강 다슈너 전 프랑크푸르트 경찰국 부국장과 부하 수사관에 대해 강압 수사와 지시, 공권력 남용 혐의로 경고하고 각각 1만800유로와 3천600유로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해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관대한 판결이지만 `특별한' 정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한다슈너 부국장은 이번 판결로 옷을 벗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인권 존중은 헌법적 국가의 기초이며, 비록 위험을 예방하려는 경우일지라도 공권력은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등 강압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특수 상황에선 고문이 허용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돼서는 안되느냐"의 격렬한 찬반 논란을 지난해봄부터 독일 사회에 일으키며, 판결 결과가 주목돼왔다.
지난 2002년 9월 독일 유명 은행가 집안의 11세 아들 메츨러가 유괴됐다.
당시경찰은 아이와 안면이 있었던 대학생 게프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으며,그의 집에서 몸값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돈을 찾아냈다.
이후 다슈너 전 부국장은 게프겐에게 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위협해서라도아이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
그러나 게프겐은 유괴 초기에 이미 메츨러를 살해했으며, 부모는 몸값 100만달러를 냈으나 아이 시신이 실종 나흘 만에 발견됐다.
게프겐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경찰의 강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다슈너 부국장은 당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생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강요했으며, 고문은 하지 않고 완력 행사 가능성만 시사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옹호론자들은 다슈너 부국장이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차악(次惡)'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에선 그들을 `최선을 다한 영웅'으로 불렀다.
반면 처벌론자들은 강압수사와 고문 등 공권력의 인권 침해 금지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가치이며, 강압 수사가 허용될 `예외적 상황'을 설정할 경우 `그 특수 상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법이 남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국제 앰네스티(AI) 등 인권 단체는 물론 경찰 공무원 노조(GDP)도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해당 경찰의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찰 공무원 노조는 사건 초기부터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의 고문 등 강압수사는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날 낸 성명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어떠한 무력, 또는 무력 행사 위협도 금지됨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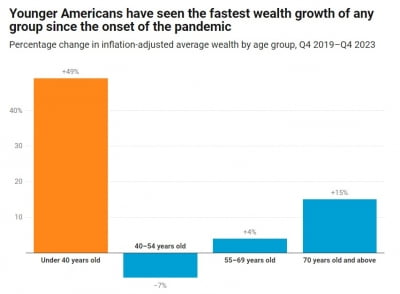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