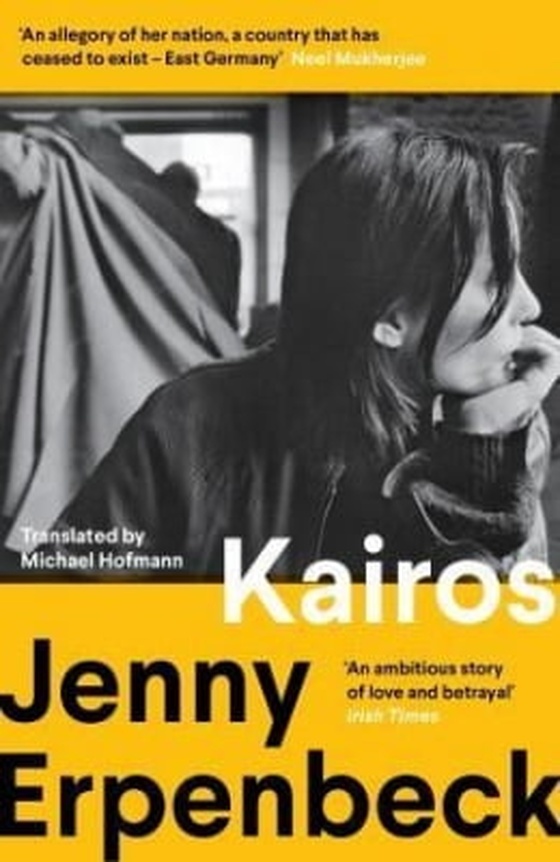입력2006.04.02 12:42
수정2006.04.02 12:46
우리나라 정부 정책중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계획이다.
'둘만 낳아 잘기르자'로 시작한 표어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보면 인구 수 4천8백만명에 가구 수는 1천6백만가구다.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3명이 된 것이다.
그 여파는 '노령화 현상'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중에서 65세 이상 비중은 이제 7%를 넘어 14%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 이상이면 '노령사회'라 부르는데 문제는 '노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노령화되어버린 사회'로의 전환이 너무 빠르다는 것.
이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을 통해 탄생한 세대가 노령화되는 반면 이들 세대가 낳은 자녀의 숫자는 줄어든데 이유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2050년께가 되면 2000년에 비해 생산가능 연령의 인구비율은 17%포인트 가량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1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또 저축률은 10%포인트 줄어들고 이에 따라 2050년께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더 있다.
바로 공적연금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후 연금을 탈 수 있는 공적연금에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네 가지가 있다.
2020년부터 이들 4대 공적연금의 통합재정수지가 2조8천5백38억원 적자로 전환돼 2050년께는 한해 적자가 1백5조7백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50년에 연금수급자는 2000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오히려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급여지출은 22.6배나 증가하지만 보험료 수입은 6배 증가에 그칠 전망이어서 지독한 적자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위에서 지적한 노령화라는 트렌드도 있지만 연금수급 구조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아가는' 방만한 구조로 짜여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들은 평균 월급의 40%를 급여로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60%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연금에 일찍 가입해 일찍 은퇴한 사람일수록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늦게 가입해 늦게 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동반한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부담은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로 급증, 복지재원의 위기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법은 '기본으로 돌아가기'다.
지금보다 많이 거두면서 연금 급여를 줄여 수급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대체상품도 만들어야 한다.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대축으로 개편하되 특히 역할이 축소되는 공적연금 대신에 기업의 퇴직금을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미국의 '401(k) 플랜'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노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할 때다.
<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chyun@mju.ac.kr >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