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19
수정2006.04.01 21:22
터치스크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벤처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손을 대면 명령을 인식하는 터치스크린은 컴퓨터 모니터나 자동입출금기에 쓰여져 왔으나 개인휴대단말기(PDA) 전자책 등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면서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불과 1년새 7∼8개 벤처기업이 양산체제를 갖추거나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중 유일하게 터치스크린을 생산해온 삼성SDI도 생산 능력을 지난해 월 40만장에서 올들어 월 60만장으로 늘렸다.
삼성SDI와 마이크로터치코리아 같은 외국 기업이 주도해온 이 시장에 벤처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에이터치는 서울 등촌동에 월 20만장(4인치 기준)의 터치스크린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오는 7월부터 공장을 가동한다.
이 회사의 장광식 대표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만드는 대기업과 협력하고 해외 유통업체와 제휴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텍시스템즈는 경기도 안산공장에 월 20만장(3.8인치 기준)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지난 3월부터 엠플러스텍 등의 PDA(개인휴대단말기)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노터치테크놀로지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터치스크린을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용인공장에서 월 2만장(15인치 기준)의 터치스크린 생산시설을 통해 10인치 이상 대형 표시장치용으로 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티엠도 지난 3월부터 월 20만장(4인치 기준)의 생산시설을 갖춘 평촌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프트앤터치는 지난해말 인천 남동공단에 월 15만장(4.3인치 기준)규모의 공장을 짓고 해외에 샘플을 보냈다.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과잉 시설투자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공장을 풀가동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터치스크린의 시장 전망이 좋긴 하지만 업체가 난립하면서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도 전에 가격이 하락해 채산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텍시스템즈의 이환용 대표는 "내구성과 신뢰성 등의 품질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며 "남보다 앞선 생산 공정기술을 갖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양산 경쟁이 본격화될 내년 이후 터치스크린 업계가 한차례 정리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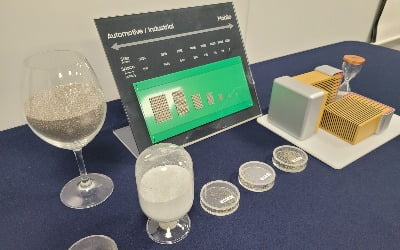




![서학개미 뒤집어졌다…다우지수 종가기준 첫 4만선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D.365799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