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 이코노미' 혁명] (4) '새로운 노사문화'
체결했다.
소속 노조원들의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연간 3% 이내로 억제한다는게
골자다.
대신 정리 해고를 최소화한다는 조항을 따냈다.
미 전기엔지니어 노조 오리건주 지부도 며칠전 끝난 지역 업체들과의 공동
단체협상에서 3년간 임금 연3% 인상에 합의했다.
작년 인상률(3.5%)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친 수준이다.
임금과 고용 안정 중 한쪽을 택하라는 회사들 쪽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노조 지부장의 얘기다.
미국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노조가 기업 눈치를
살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조 천국 으로 통해 온 미국에서 노조의 기세가
크게 꺾이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70년에만 해도 2백50만명에 달했던 미국의 파업 노동자수가
지난 96년에는 27만3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97년 이후의 파업 참여자수는 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서적으로 따지자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노동의 공급자인 노조쪽의
발언권이 더 세야 마땅하다.
그런 상식이 깨지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몇가지 점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별 기업 차원의 왕성한 고용 조정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무한 경쟁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 조정, 최근 잇달고 있는 기업들간의 대형
M&A(인수 합병) 등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작년 한햇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증발한 일자리만도 37만5천여개에
달한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컴퓨터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직장에서 느끼는 고용 불안은 그만큼 노동자들을 몸조심
시키고 있다.
노조들이 고용 보장 쪽으로 전략의 중심을 바꿔나가고 있는 이유다.
철강 노련의 조지 베커 의장은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상황 변화를 솔직하게 수용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몇 푼의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미국 노사 관계의 방향 선회는 보잉사의 경우에서 보다 확연해진다.
보잉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 기계기사협회(IMA)측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단체 협상을 앞두고 불가피한 고용 조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이미
회사측에 통보했다.
지난 95년말의 협상 때 고용 보장 등의 쟁점을 놓고 69일에 걸쳐 파업을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상처만 컸음을 절감한 결과다.
보잉은 파업 후유증 등으로 지난 4년간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고 주가는
30%나 떨어지는 타격을 입었다.
결국 5만명의 정리 해고로까지 이어졌다.
제프리 가튼 예일대 교수는 비즈니스 위크 칼럼에서 오랜 시행착오 끝에
미국 기업들의 노사 양측이 서로가 피할 수 없는 공동운명체임을 절감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폴 크루그먼 MIT 교수는 포천 칼럼에서 글로벌화 요인 을 추가한다.
글로벌화로 기업간에 생존을 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노사 모두
국내외 라이벌업체들과의 경쟁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코넬대의 해리 카츠 교수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아웃 소싱 요인을
덧붙인다.
미국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인력 파견회사
소속 임시 직원의 채용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 직원의 증가는 노조의 파워를 약화시키는 요소인 게 사실이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 오히려 노사간 힘 의 중심축이 회사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다.
노사 분야에서까지 뚜렷해지고 있는 신경제 현상은 미국의 국제 경쟁력에
또하나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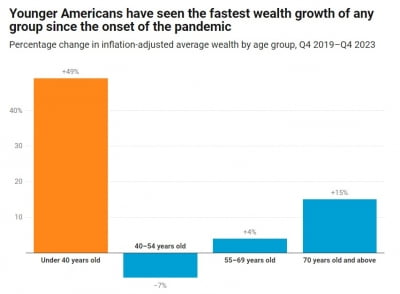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