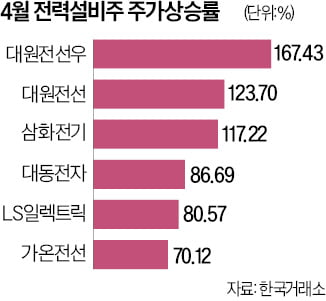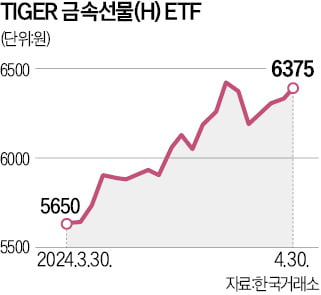[증권가사람들] (73) 채권맨 <1>..채권 맛들이면 주식 뒷전
사연들도 있다.
비록 화려하고 역동적이진 못하지만 증권가의 한구석에서 말없이
자본시장을 받쳐온 채권맨,그들만의 얘기이다.
채권시장의 생리는 주식시장과 차이가 있다.
주식시장이 승자와 패자가 명백히 갈리는 치열한 격전장을 연상케한다면
채권시장는 더많은 전리품을 얻기위해 싸우는 승자들의 잔치이다.
그래서 돈 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채권투자의 묘미를 내밀하게
즐겼는지모른다.
물론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수있는 주식투자에 대한 미련도
없지않았다.
그래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채권만한게 없다고들 말한다.
채권에 맛들리면 주식못한다 는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않다.
수익률계산이 복잡하고 돈이 잠겨있으니 무슨 재미가 있냐는 것이다.
유통수익률 연15%라야 얼마나 번다고 코웃음을 칠지 모른다.
주식시장에서 종목만 잘 잡으면 그정도 수익률이야 하며 말이다.
그러나 금리전망이 엇갈릴 경우 주식보다 치열한 매매공방이 있고
주식보다 더많은 과실을 거둘수있는게 채권시장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 고 시세는 항상 채권에서 났다.
적어도 오랫동안 자본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증권사들도 10년중 1,2년은 주식에서 재미를 보지만 나머지 기간은
채권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환매채를 편입할 경우 단자사나 기업어음할인을 통한 것보다 낮은
코스트로 자금을 조달할수있고 때에 따라선 자본차익을 챙길수있는
잇점까지 있다.
최악의 경우 금리가 올랐을때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초 매수수익률에
수렴하기때문에 크게 손해날게 없다.
채권으로 돈을 벌고 부리던 사람에게도 희비가 있었고 애환이 있었다.
자본시장초기단계에서 건국국채와 지가증권에 관심을 기울여 60년대
S증권을 인수한 J씨.
채권의 권종이 낮아 발로 밟고 저울로 달아 시세를 정하던 시대엔 채권을
부지런히 모은 노력의 댓가를 반드시 지불받았다.
올봄에 타계한 백할머니도 50년대 국채투자를 통해 재력을 쌓았다.
한국전쟁이후 동아건설도 건설 토목경기호황을 바탕으로 대규모자금을
국채에 투자,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채권시장 초창기에는 증권업자끼리의 투기적 책동전도 만만치않았다.
공매수 공매도등의 방법으로 시장이 뜨겁게 가열돼 1.16국채파동(58년)을
겪으며 채권사에 얼룩을 남기기도 했다.
유휴자금을 산업화한다는 기본취지와는 반대로 채권과의 악연으로
역사속으로 퇴장한 기업들도 나왔다.
83년 동양증권과 합병된 삼보증권의 파산을 증시불황에 따른 시재부족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별로없다.
오히려 증권계에서는 어음사기의 명수 장영자여인에게 수백억원의
유가증권을 빌려주었다가 날린것이 도산의 배경이라고 전해지고있다.
85년 국제그룹의 파산도 채권과 무관치않다.
80년대초반만 해도 공무원연금공단등에서 채권을 빌려 이를 담보로
증권사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던 완매체가 유행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었던 시절에 편법 자금조달방법이 나름의
기능을 했던 때였다.
금리는 천차만별인 완매채를 정부가 전격 금해버리자 국제그룹이
자금난에 몰렸다.
정치적인 배경과는 별개 얘기이다.
그래도 채권시장은 국가재정마련에 기업자금조달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일반인들의 채권에 대한 인식도 많아 달라졌다.
90년대들어 절세매매라는 것이등장하고 일반인들의 통장거래도 자리를
잡았다.
최근들어 채권중도매매시 종합과세여부를 놓고 긍융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채권시장의 비중이 커졌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