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레 늘어난 공공기관…국회와 정부 부처의 은밀한 공모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면 더 기가 차다. 공공기관 난립의 주된 창구는 의원입법이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통과시킨 각종 지원법과 육성법으로 공공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만 확보되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가신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에 의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산지원관리법’에 의해 수산지원사업단이 각각 공공기관으로 ‘등극’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공공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을 근거로,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새로 생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건 일부 정부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청부입법이다. 처음엔 민간단체로 출범시켰다가 해당 부처가 위탁 사업을 늘리면서 슬그머니 공공기관으로 둔갑시키는 방식도 동원된다. 이쯤 되면 편법의 극치다.
공공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국회를 통해 어느새 공공기관이 더 늘어난 것이 마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새로운 규제를 마구 찍어내는 것과 판박이다. 국회와 부처가 공공기관 늘리는 데는 ‘찰떡 공조’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자리 늘리기다. 정치인, 퇴직 공무원들이 득실거리지 않는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모든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의원입법 남용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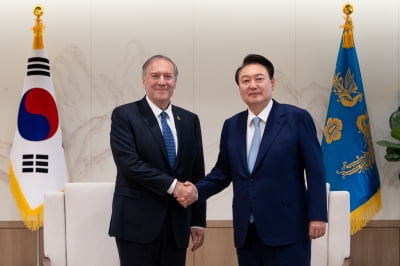








![[단독] '2조' 도박사이트 덮쳤는데…비트코인 1500개 실종 '발칵'](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12278.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아르떼TV 핫클립 : 피아니스트 아서 그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0965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