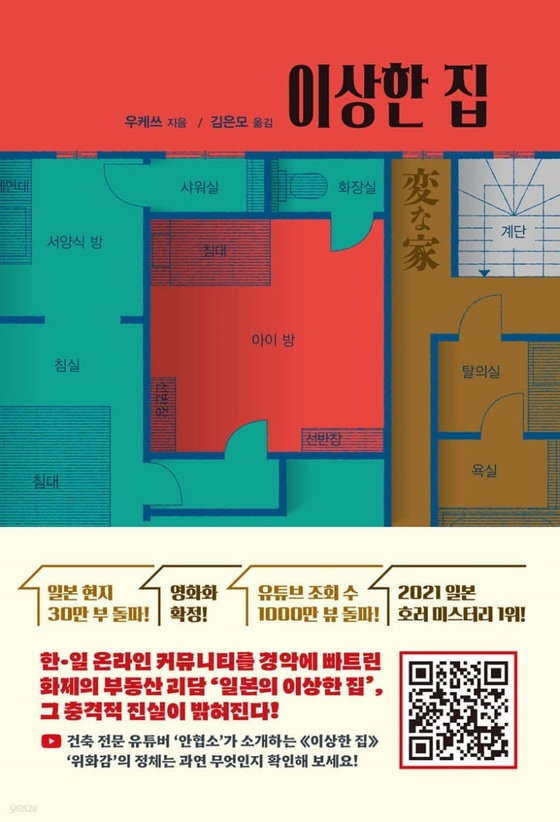[혼선 빚는 부동산정책] 주거환경관리사업 왜 지지부진한가
지난해 마을을 새로 단장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 239의 1 일대는 ‘서울시 1호’ 주거환경관리사업지다. 1325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0년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함께 ‘휴먼타운’(뉴타운지구 내 기존 주거지 보존·개보수 지역) 시범구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2012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바뀌었다.
시는 이곳에 방범·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로등 개수를 늘리고 조도를 개선한 데 이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윤영원 마포구청 주택과 재건축팀장은 “이곳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사업추진 이전부터 주택 상태가 양호한 동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노후화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잘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당초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동네는 관리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도로를 확장하고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곳”이라며 “뉴타운·재개발과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주택이 노후한 곳보다 주변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과 오래 거주한 토착민이 많은 곳일수록 재개발 대안 사업인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적용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 매물마당] 용인시 역북지구 본사 직영 슈퍼마켓 등 5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72726.3.jpg)


![나스닥, 역대 최고치 경신…다우는 4만선 아래로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70.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