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증권사들 '채권관리' 고민되네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나서
증권사들이 지난해 말 금리 급락(채권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채권평가익이 생겨 금융위기를 벗어나는데 톡톡히 덕을 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판매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 잔액은 지난 9월 말 25조9893억원으로 올 들어 5조8000억원 불어났다. RP형 CMA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RP에 투자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보유 채권도 RP형 CMA에 비례해서 급증했다.
올 하반기 들어 출구전략 우려감에 시중 채권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채권평가액이 크게 줄어 자칫 상당한 평가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일부 증권사들은 가격 하락폭이 큰 단기채권을 팔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는 장기채권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장승욱 우리투자증권 채권팀 과장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단기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CMA의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현재 회계장부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돼있는 RP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면 분기 손익계산서상의 평가손실로 잡히게 되지만,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돌리면 평가손실이 자본조정계정으로 가서 단기손익에서는 빠지게 된다. 이는 원래 불가능했지만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허용해줬다.
실제 대우 현대증권 등은 지난 7월 이후 보유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돌리고 있고 우리투자증권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교체 매매가 불가피해 만만치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기업회계규정상 이미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을 팔고,이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새로 매입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교체 매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매입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팔아야 하므로 일정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0.01% 정도의 거래수수료(장외거래기준)도 내야 한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부 팀장은 "채권평가 금액이 줄었더라도 만기까지 들고가면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데도 교체 매매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봐야하니 속이 쓰리다"고 하소연했다.
김동윤/강지연 기자 oasis9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5월 넷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35443690.3.jpg)
![빅테크 강세에 반등 성공…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10975074.3.jpg)
!["금리 안 내려도 상승" vs "랠리 지쳤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28828.3.png)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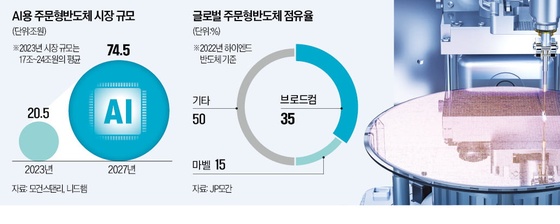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