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강국?…'밥그릇 싸움'이 걸림돌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을 절반씩 추천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된 의료기기산업 진흥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제외하고 복지부와 산업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토록 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준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과장은 “법에 식약처 역할을 규정한 대목이 거의 없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식약처의 정책 지원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의료기기법에 식약처의 산업 육성 기능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제정안에 식약처도 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다.
복지부의 견해는 다르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부처 간 협업은 필요하지만 하나의 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다 보면 간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농업 육성은 농림부가 맡고, 농식품 허가는 식약처가 담당하는 것처럼 선수와 심판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다. 2013년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된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 산업부 등이 의료기기 산업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201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육성 법안이 발의됐으나 산업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밥그릇싸움 탓에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가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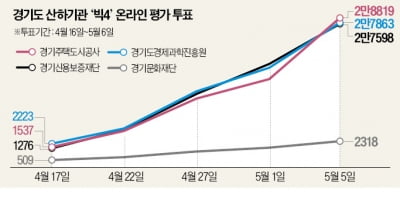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이 아침의 바이올리니스트] 유럽 오케스트라 벽 뚫은 거장들의 파트너, 이지혜](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207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