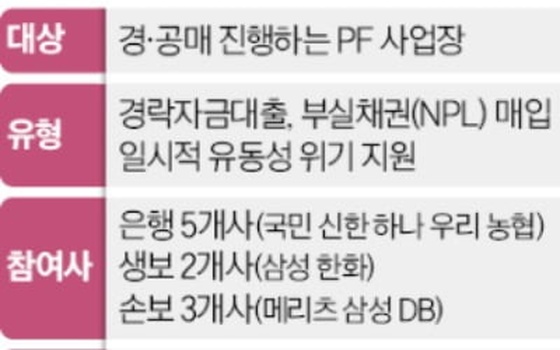신림1·노량진3 재개발 '건설사 공동 시공' 놓고 조합 내 갈등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림1구역(사진) 재개발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2차 정기총회를 연다. 총회에서는 건설사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림1구역은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이 두 차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정비사업은 경쟁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신림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향후 2886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지다. 경전철 신림선 개통 등 교통 호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신림1구역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를 놓고 내홍을 겪었다. 일부 조합원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되면 아파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공사 입찰 규정에 ‘컨소시엄 입찰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사 측은 단일 브랜드 선택권, 단일 시공 등 컨소시엄 방식의 보완책을 조합원에게 제시했다.
비슷한 현상은 동작구 노량진3구역에서도 발생했다. 이곳은 지하 4층~지상 30층, 총 1272가구의 아파트촌으로 재개발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합원이 반대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방식을 꺼리는 조합원은 하자 보수 미흡 등 아파트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공 책임이 분산돼 협의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도 단점이다. 반면 컨소시엄 방식을 통해 건설사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인력이나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