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면제 남발, 신규사업 부실…나라살림이 이래도 되나
예타 면제 규모는 2015년 1조4000억원, 2016년엔 2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17조원대로 뛰더니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 가운데 8할이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소위 ‘지역 숙원사업’이 즐비하다. 다분히 선심성이고, 국가 전체로 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는 얘기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뉴딜 사업이 추가돼 예타 면제가 더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주말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광역시 등을 방문해 “(전남·북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절박한 마음”이라며 KTX 전라선 예타 면제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원의 내년 예산안에 부실 가능성이 농후한 신규 사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우려를 더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신규 예산사업의 27%(1조1065억원)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과다편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사업의 경고가 많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지 않아도 맹탕 재정준칙을 내놓은 정부가 예타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실 예산사업을 배제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서 나라살림을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말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산국회는 ‘선심성 예산 불가’ 원칙에 입각해 방만·부실사업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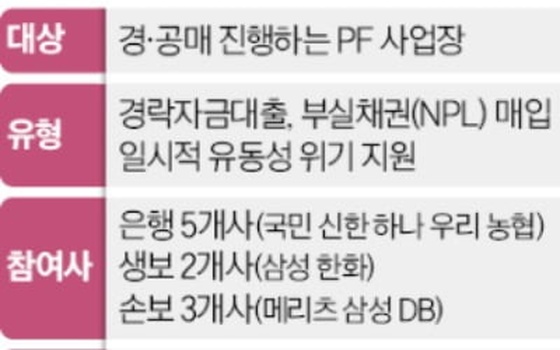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22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