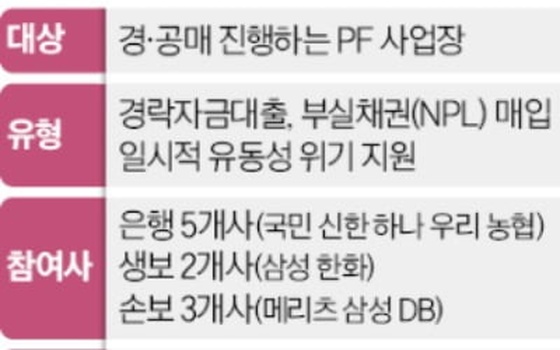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사설] '협상'이 '전쟁'이 된 시대, 우리의 역량 괜찮은가
국익 관철 위해선 우방국과도 '총칼 안 든 전쟁' 불사
국가아젠다 분명히 하고 전문가 키워 철저 대응해야
다음 회동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먼저 판을 깬 미국의 속셈과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 정부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4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 “혈맹인 미국이 한국에 한꺼번에 5배씩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식의 울분이나 다분히 선동적인 ‘동맹 무용론’을 펼 때가 아니다.
우방 간, 동맹 간에도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다. 국익을 지키는 게 총포보다 국가 간 협상과 협정이다. 양자 간이든 다자 협상이든 마찬가지다. 장기화된 미·중 통상무역 갈등이 그렇고, 교착화된 한·일 관계도 다르지 않다. 방위비 분담을 협의하면서 협상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최대압박을 노골화한 미국도 그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EU 간 농산물 관세 갈등도 우방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협상이다.
외교안보와 통상무역에서 우리의 대외 협상력은 어느 정도인가. ‘수출규제’에 지소미아 문제를 자충수처럼 끌어들인 것이나, 중국의 ‘사드보복’에 지레 ‘3불(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 않겠다) 정책’을 약속해버린 것은 국제적으로도 아마추어 외교 사례로 남을 수 있다. 협상학의 기본이라도 안다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편승해 정부 입장을 정하거나, 대외관계에서 ‘죽창, 의병’ 운운하는 어이없는 일에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벼랑 끝에서 자기 이익을 관철시켜온 북한의 협상술을 배워야 할 판이다.
지금 정부에 미국통, 중국통이 있는가. 통상 전문가와 협상전략 전문그룹은 있는가. 여야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문제로 미국으로 성급히 떠났지만 협상가가 없고 외교 전문가가 안 보이기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가 아젠다는 선명치 못하고, 외교안보 문제로 국내 갈등이나 심화되고 있으니 전문가 그룹이 육성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대사의 향후 대응은 지켜봐야겠지만, 외교안보 지형이 이처럼 복잡한 시기에 공직 30년을 경제금융 관료로 지낸 그를 수석대표로 내세운 채 수조원짜리 협상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 주한미군까지 흥정 대상처럼 된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 행보까지 본다면 일회성 ‘돈 협상’이 아니다.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키울 곳은 현안이 산적한 대일, 대중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총칼 없는 전쟁인 국가 간 협상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건 아닌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