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줄 세우는 투쟁 안 따르면 보복…'민주' 사라진 노동운동
다행히 타결됐지만 이번 파업은 한국 노동문제의 본질이 조직된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간 ‘노노(勞勞) 착취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 임금 인상을 고리로 걸긴 했지만 대형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핵심 요구는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다.
대형 크레인 노조의 오랜 ‘갑질’ 탓에 공사 현장에서 대부분 비노조원 기사가 운전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인기가 높아졌고, 일감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실력 행사가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4년 14대이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수는 현재 1850대로 급증했다.
‘노동자의 적은 사용자’라는 통념은 한국에서 낡은 생각이 되고 말았다. 대신 강한 노동자가 약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태가 요즘 거의 모든 노동이슈에서 목격된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급등도 정부와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과 공기업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선상의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역시 거대 노조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점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억압과 착취구조가 조직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간에만 있는 건 아니다. 거대 노조 상호 간, 또는 거대 노조 내부에서도 뺏고 뺏기는 생존게임이 일상사가 됐다. 건설현장에선 민노총과 한노총이 서로 소속 조합원의 독점적 고용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주먹다짐도 예사로 벌이는 게 현실이다. 조합 내부에서도 폭력을 동원한 줄 세우기와 ‘왕따’가 빈번하다.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는 회사 분할 주총저지 농성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쥐새끼’라 부르며 따돌리고 있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이 ‘집단구타’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확산되는 ‘노노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파업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료가 기존 크레인보다 10~20배 비싼 이동식 크레인을 쓴 건설사가 속출한데서 잘 드러난다. 이번 사태는 ‘폭주 노조’가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고 입주 지연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90%의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자신의 몫을 더 챙기는 이기적 행태는 노동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파업한 노조 기사에게 염치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공사 현장의 절규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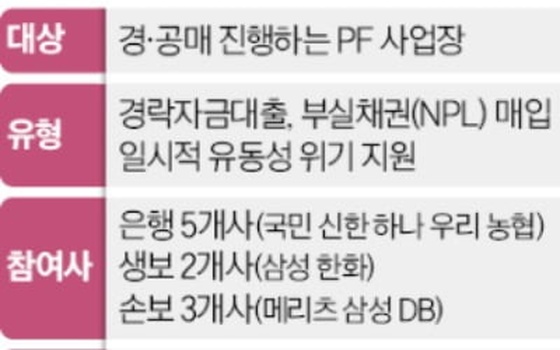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31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