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크도록 서둘러야
![[사설] 이제는 '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620911.1.jpg)
특히 주목된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속도를 내왔지만, 이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박정수 서강대 교수의 연구 논문이었다. 박 교수의 분석은 한마디로 ‘임금인상 없는 성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이론의 맹점을 짚은 것이었다. 그 근거로 그는 ‘2000년 이후 17년간 한국의 명목임금은 139% 오른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107%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1987년 민주화’ 직후 1988~199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 5.9~9.2%였으나 임금상승률은 15.1~17.6%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았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정부와 관변 학계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과 궤도 수정론을 낸 것이 주목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이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문 정부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어 노사관계가 나빠졌고 사회협약도 어려워졌다”며 작정한 듯 비판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경제성장의 근본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재인식해야 한다. 임금은 수익의 배분이고, 생산성의 결과다. 생산성을 높이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면 올라가는 게 임금이다. 일자리 창출도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이어야 한다. 형평의 논리에 함몰돼 ‘기계적 기회 균등’에 매달리면 기껏 관제(官製)일자리 만들기나 획일적 정규직화밖에 못 본다.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관의 대등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는 더 절실하다. 핀테크 금융, AI와 빅데이터, 원격진료 등 첨단 분야가 앞서야겠지만, 어떤 산업도 어느 기업도 예외는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 29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22위(2017년)’가 냉정한 한국 현실이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정·공공개혁도 생산성 높이기 차원에서 보면 답은 나와 있다. 특히 고용과 근로의 유연성, 시장자율 기반의 경제관련 법과 제도 정비 같은 과제는 국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다. 최악의 청년실업과 심화되는 양극화, 최근 급등한 환율 등을 보더라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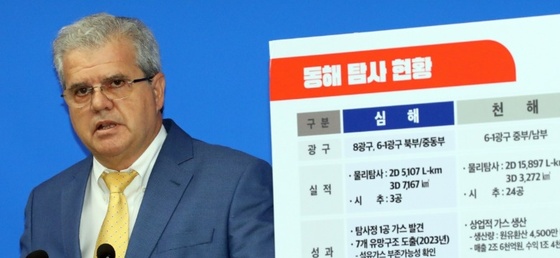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