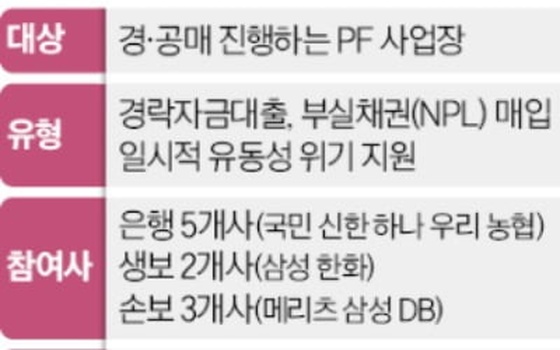입력2006.04.02 13:58
수정2006.04.02 14:02
어제 부모님의 산소에 갔다.
어쩌다 답답한 일이나 있어야 찾아가는 묘소에는 풀들이 가득 자라나 있었다.
잠시 머물다 돌아서 내려오는 길에 이미 색이 바랜 철쭉꽃잎들이 개울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이 개울물 속 작은 돌멩이에 엉켜 있는 꽃잎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때가 떠올랐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늦은 봄날 집에 들어섰더니, 고향에 살던 삼촌이 와 있었다.
삼촌은 40이 다 돼갔지만 그 때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할머니와 고향에서 살고 있었다.
삼촌은 어린 날 서울에 있는 중학으로 진학해 어느 한옥 문간방에서 6년 자취하는 동안 온돌방에 불한번 지피지 못하고 냉 구들에서 겨울을 보내느라 폐결핵을 얻게 돼 고향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방에서 삼촌과 함께 지내게 했다.
그런데 삼촌은 삼촌의 보따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나에게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마당으로 나가곤 했다.
일요일 오후였다.
텅빈 집에 삼촌과 나만 있게 됐다.
삼촌은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 앉아 빨래를 하는 것이었다.
양말 수건 등 삼촌이 고향에서 가지고 온 일용품을 비누칠해 빨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삼촌, 빨래를 부엌에 내놓지 그래"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촌은 웃으며 "아니다, 내 빨래는 내가 하는게 습관이 들어서…" 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에게 "삼촌이 혼자 빨래를 하던데…" 하고 말했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어머니는 "삼촌이 아프지 않니" 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나가셨다" 하는 것이었다.
아무 것도 몰랐던 나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삼촌이 내려간 다음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는 쑥을 한보따리 가지고 왔다.
어머니는 이 쑥으로 쑥떡을 만들었다.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모인 늦은 밤 어머니는 쑥떡을 내놓았다.
빙 둘러앉아 쑥떡을 먹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던 여동생이 "엄마, 쑥떡은 맛이 없어. 찐빵을 만들어 줘"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맛있는데 왜 맛이 없다고 해" 하면서 여동생을 달랬지만, 여동생은 다시 투덜거렸다.
할머니는 여동생의 손을 잡으며 "그래 찐빵이 더 맛있을거야"하고 웃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돼 여동생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 며칠 뒤였다.
온 가족이 저녁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몇가지를 타일렀다.
막내에게는 삼촌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고개를 옆으로 돌렸던 것을 지적하면서 "삼촌이 얼마나 속상했겠니"하고 말했다.
여동생에게는 "할머니가 서울 오시기 전에 들판을 헤매며 쑥 뜯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니"하고, 나에게는 "삼촌이 서울서 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서울 거리가 보고 싶었겠니"하면서 서울구경의 안내자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과 만나는 세상에 드러난 얼굴 속에 감추어진 참다운 얼굴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일러주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겉 얼굴이 아닌, 감추어진 참다운 자기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상처난 마음의 흔적을 드러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초라한 자기의 못남을 드러내 놓아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족 누구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삶의 단위'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비극인 것이다.
한가족으로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고, 고생을 고생으로 알아주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관계로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의 사이에 끼여 들어 없는 서러움으로 마음을 가리고 산다면, 무엇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엉켜 살게 하는 것이 되겠는가?
인생은 이러한 기본적 혈연의 연대를 토양으로 해서 새 순이 돋아나듯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 pdk@poet.or.kr >
![[한경에세이]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74328.3.jpg)
![[다산칼럼] 도덕적 해이의 장(場)이 된 실손보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2519856.3.jpg)
![[백승현의 시각] 노동개혁 안되는 또다른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1748326.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