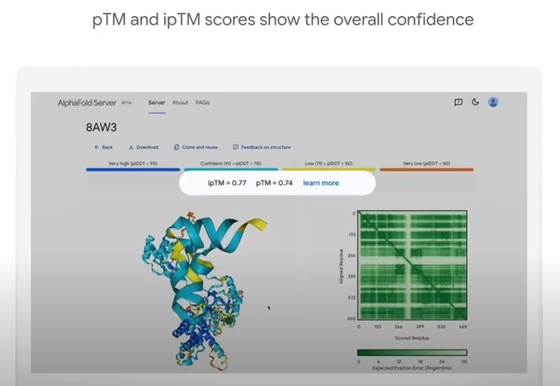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Y-파일] (신세대 신조류) "보장된 미래싫다" 나만의 길찾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의 운명을 시험해보고 싶다"
학교마치고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 대리 과장 거치며 승진해가는 정해진 삶.
우리네 대다수는 이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톡톡튀는 개성으로 학창시절을 보낸 신세대들은 사회진출에서도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거부한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사한 곳이 꿈꾸던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나선다.
행정사무관을 팽개치고 개그맨으로 변신한 노정열(27)씨.
촉망받는 관료의 길을 떨치고 남을 웃기는 "배우"의 길을 택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또래의 대학친구들처럼 고시를 준비했고 남다른 노력으로 버젓이 합격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일을 익히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공무원생활이
그에게는 재미없는 일에 불과했다.
세상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기왕이면 재미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새로운 길을 택했다.
지금은 편안한 웃음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더많은 것을 해준다는데
만족을 얻고 있다.
"딴따라"라는 비아냥을 받던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제 신세대들이
선망하는 인기직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직업을 바꾸는 경우는 예전에도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신세대들은 맘에 드는 일을 하고 있다며 자족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욕심은 신세대만의 특권.
아시아나항공 부조종사 금경호(30)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고액연봉을 받던 은행원 직업을 때려치고 2년여의 교육과정을 자청해
항공기 조종사가 된 그는 지금도 승객의 안전과 스스로의 목숨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보다 앞서기위해 지금도 자신을 채찍질한다.
신세대들의 이직바람은 창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조직에 얽매이기 보다는 위험하지만 자기 일을
해보고자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나서기도 한다.
박병엽(34)씨는 스물아홉의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보통신기기
개발생산업체인 팬택을 설립해 지금은 연매출 6백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일궈냈다.
"피동적이고 무기력한 샐러리맨으로 살기에는 젊음이 너무 아까웠다"는
그는 떨쳐 일어나 마침내 변신에 성공했다.
명예퇴직이나 감원바람이 불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더욱 엷어져가면서
늦기전에 자기사업을 해보겠다는 창업붐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능력에 따라 혹은 욕구에 따라 이직 아니면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고급인력이나 기술자를 찾아내 연결해주는 헤드헌터
(Head Hunter)나 창업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알려주고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창업컨설턴트업체들도 이같은 신세대 새흐름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려한 도전적인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혁명이 이뤄졌다"는 토머스 쿤의 명제처럼 신세대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람경영, 욕망이 시장이다 [한경에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60695.3.jpg)
![[한경에세이] 노키즈존 500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조일훈 칼럼] 왜 멀쩡한 국민을 남의 돈 넘보게 만드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383340.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