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내 포털 첫 노조 출범… 인터넷업계도 노동 이슈에 휘말리나 '촉각'
노조 "일방적 의사소통 구조
회사 성장에도 복지 뒷걸음질"
IT기업 노조 설립 잇따를 듯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에
한국MS·오라클 작년 노조 결성
"親노동 정부 출범도 영향"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의 수평적 조직문화는 수직 관료적으로 변했고 회사의 엄청난 성장에도 복지는 뒷걸음질쳤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측은 소통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를 선택한 것과 관련, “어떤 산별노조에도 우리와 같은 IT 기업이 없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사측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 설립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내외부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고 스포츠뉴스 부당 편집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급한 인센티브가 늘어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의 불만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적은 좋았지만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인공지능(AI), 로봇,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인센티브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투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오라클이 창사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세웠다. 두 회사 모두 고용 안정을 노조 설립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기존 주력 사업부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사업부와 미들웨어 사업부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은 세계 DBMS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다. 하지만 기존 고객사들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DBMS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클라우드 사업으로의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전 세계 직원 3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났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업 분야 등의 인력이 희망퇴직 1순위였다.
전문가들은 IT 기업의 노조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IT업계 특성상 기존 인력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기 때문이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은 “친(親)노동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 조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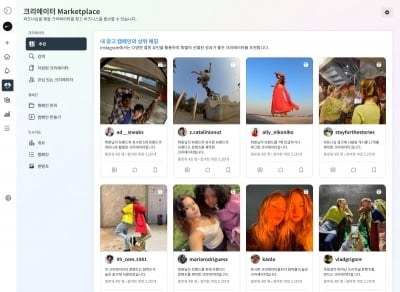
![[Cover story – NOW] NOW Degradation, 프로탁과 분자접착제의 임상개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70783.3.jpg)
![[Cover story – OVERVIEW] TPD, 표적 단백질 분해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신약개발 플랫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70576.3.jpg)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이 아침의 소설가] 19세기 금기 불륜 그려 재판…'마담 보바리' 작가 플로베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8997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