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유럽, 환율전쟁 역풍…중앙은행 약발 다했다"
중앙은행들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연초 시작된 시장의 변동성이다.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통화는 엔화로, 통상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될 때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면서 가치가 오른다.
1월 말 일본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대대적인 돈풀기에 나섰지만,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크게 절상됐다.
유럽 역시 올 초 대규모 부양책을 단행했으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무엇이든 하겠다'는 약발은 더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유로화는 당국의 추가 부양책에도 미 달러화에 대해 오름세를 보였다.
이같이 추세가 바뀐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네 차례 인상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FT는 연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미국은 그간의 환율전쟁에서의 실패를 설복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준은 금융위기 직후 1차 양적완화를 단행하며 달러화 약세 기조에 한동안 수혜를 입긴 했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쟁적인 부양책으로 달러화가 강세 전환돼 한동안 타격을 입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환율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중국과 영국이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FT는 지적했다.
중국은 작년 8월 위안화 가치를 크게 절하시켜 환율전쟁에 동참했고, 영국은 브렉시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FT는 환율전쟁 구도의 변화로 일본과 유로존은 더욱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화정책으로 이들 나라가 상당한 효과를 봤던 유일한 부문이 통화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경제가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개선될지 여부다.
만약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다면 추세가 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은행들은 수익 악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FT는 금리 인하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회복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책 마비가 유행인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영숙 기자 ysyoo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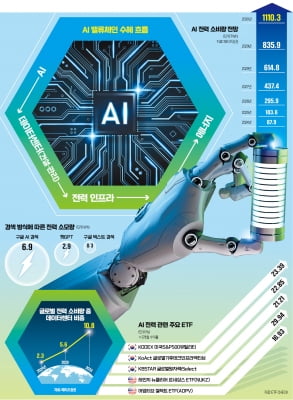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이 아침의 소설가] 19세기 금기 불륜 그려 재판…'마담 보바리' 작가 플로베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8997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