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42
수정2006.04.02 14:44
국내증시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JFAM(자딘플레밍에셋매니지먼트)아시아본부가 위치해 있다.
작년 10월 이 회사는 삼성전자등 우량주를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9.11테러이후 홍콩에 아시아투자본부를 둔 대부분의 글로벌투자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주식 비중확대였다"(AXA인베스트먼트홍콩 강미정 펀드매니저).그당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는 600,700선을 잇따라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 기관들은 이방인을 자처하듯 비관론을 되뇌였다.
마침내 종합주가지수가 800을 넘어서자 기관의 태도는 1백80도 달라졌다.
대세상승론을 외치며 일제히 "사자"에 나섰다.
최근 튼튼한 국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터진 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파문이 그 촉발제였다.
시장의 안전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관의 현주소와 위상재정립 방향을 모색해 본다.
주가지수가 피크를 쳤던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거래일 기준) 외국인은 1조5천억원 규모의 차익매물을 쏟아냈다.
국내 기관은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 기간에 지수는 940에서 800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유럽계 투자회사 크레딧애그리콜(CA)애셋매니지먼트의 펑궉온(Fung Kwok On) 펀드매니저는 "그때는 지수 850 이후 한국 주식의 비중을 언제 어느정도 줄일까 하는 게 홍콩 금융가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전했다.
지난 99년 대세상승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주도권은 외국인이 쥐고 있었고 기관은 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었다.
외국인은 이런 역학구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한국 증시를 쥐락펴락했다.
이달초 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리포트가 국내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주에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적인 선물매매가 증시를 출렁거리게 만들었다.
2천억∼3천억원의 자금으로 시가총액 3백30조원의 한국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증시가 이처럼 '외풍(外風)'에 약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내 기관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3월말 현재 국내 기관의 주식보유 비중(거래소 시가총액 기준)은 15.8%로 외국인(36%)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국내 기관의 비중은 30%로 외국인(13%)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98년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종목당 투자한도 1백%)된 이후부터 국내 기관은 '조막손'으로 변했다.
기관의 투자비중이 낮아진 계기는 IMF 외환위기였다.
그 이후 두차례에 걸친 증시침체를 겪으면서 '주식=위험자산'이란 개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기관의 투자비중이 낮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강창희 굿모닝투신 사장은 "장기투자 재원이 부족한 게 최대의 취약점"이라며 "기껏해야 1년짜리 자금으로 5∼2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자금으로 무장한 외국인을 당해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관자금의 단기화는 투자자들의 성향,장기상품 부족 및 단기수익 위주의 운용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다.
과거 20여년 동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한국 증시의 발자취도 한 요인이다.
김석규 B&F투자자문 대표는 "국내 기관이 바닥에서 주식을 팔고 상투에서 사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주가 바닥권에서 환매(자금인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고점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란 것.
최근들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90년대 미국 증시의 10년 호황은 연기금,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권욱 코스모투자자문 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과실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그 과실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면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기관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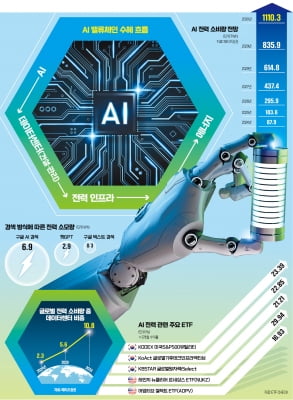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이 아침의 소설가] 19세기 금기 불륜 그려 재판 '마담 보바리' 작가 플로베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8997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