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 되려고 당 대표에게 구애 경쟁하는 정치 희극
어제 경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애 경쟁에 나선 것부터 그렇다. 조정식 의원은 “이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했고, 우원식 의원은 “이 대표의 실천적 사회개혁 노선에 동의하는 가치 동반자”라고 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 대표와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이심전심을 내세웠다. 저마다 이 대표 연임론도 띄우고 있다. 마치 충성 맹세를 방불케 하고, 국회의장을 당 대표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 자리를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의장 중립 의무를 어기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 주장은 거대 야당 독식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판을) 깔아주겠다,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 주장대로 하겠다 등의 발언도 잇따른다. 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이렇다면 누가 돼도 이 대표 뜻대로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회의장이 조정자라는 기본적 역할을 팽개친다면 극심한 여야 충돌을 부를 게 뻔하다. 게다가 민주당 주요 당직이 모조리 강성 친명으로 채워졌고,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마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 그러나 독주는 오만을 부르고, 민심의 역풍으로 이어진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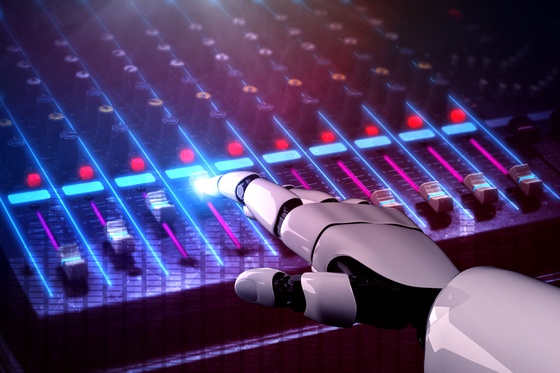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