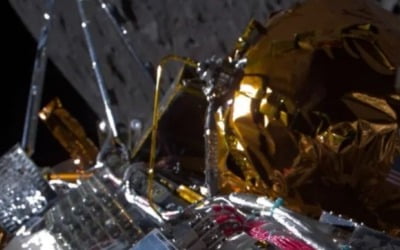-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고 "원래 주인에게 환원한 것"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첫째 형의 배우자 B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A에 부과된 1억927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등을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500주를 시가(7억8693만원)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1억7500만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B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증여세 1억927만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435만원을 재고지했다.

실제로 A씨의 회사는 A씨의 첫째 형을 발기인 대표로 해 2001년 설립됐고, 형이 사망한 이후 둘째 형이 대표를 맡았다. 이후 둘째 형이 사망하자 A씨가 대표를 맡았다. 이 회사 설립 시 자본금 5000만원은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당시 회사 주식은 A씨와 나머지 형제 3명이 각 25%(각 25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05년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남편이 가졌던 회사 주식 25%의 명의도 B씨로 변경됐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다"며 "원고들 사이엔 매매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B씨는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씨가 "자신이 나머지 형제들이 보유했던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한 것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제들은 물론 원고 B씨 역시 대표이사, 감사 등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며 "나머지 형제들이 단순히 주식을 명의 수탁 받은 형식적인 주주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과세당국의 주식평가액 등이 자의적으로 산정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진행하는 조세 법규를 따른 조사 방법을 통한 산정액을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