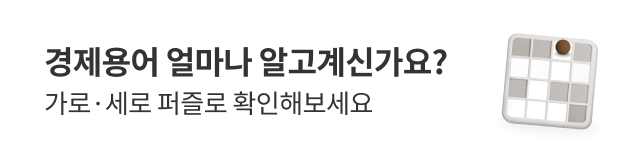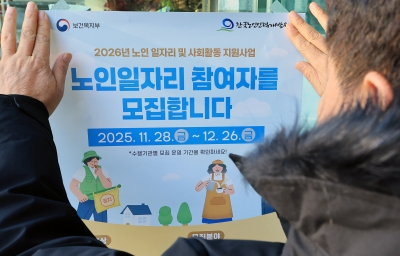쿠바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는 “하나의 조선만 있을 뿐”이라며 김일성과 ‘참호를 공유’하는 반미의 끈끈한 연대를 맺었다. 쿠바는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를 거부했고, 최근까지도 북한과 교류를 이어왔다. 그런 쿠바가 김정은이 ‘불변의 주적’이라고 한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일 것이다. 식량난 등 피폐해진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이념보다 한국과 수교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도발로 제재를 자초하는 북한식 폐쇄 노선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으로 잇달아 대사관을 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외교 무대에서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핵·미사일 폭주는 고립만 초래할 뿐이고,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북한의 모습을 한·쿠바 수교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로선 외교 지평을 넓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압박 목소리를 키우고, 완성차와 부품, 전자제품, 휴대폰 등 쿠바와 사업 관계를 구축해 온 기업 운동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외교력을 쏟아부은 우리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쿠바 현지의 한류 열풍과 꾸준한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연성 외교’가 수교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수교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의 종북 인식과 ‘우리 북한’류의 수상한 안보관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한·쿠바 수교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