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개발 허가만 최장 6개월…한강환경청에 속타는 서울시
市 "무조건 불허 땐 답답" 불만
10일 양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와 가장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다. 수상버스를 운영하려면 일반 도로에서 선착장까지 차량, 자전거,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주변을 정비해야 한다. 노들섬에 새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나 여의도 선착장 확대(서울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서울링’ 설치도 모두 환경청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환경청에 문의가 들어가면 답을 받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시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서울시는 마포 난지 캠핑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지난 2월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환경청에 신청했는데 4월 중순에야 ‘하천점용허가 불가’를 통보받았다. 환경청 관계자는 “캠핑장을 조성할 때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만 쓰던 공간을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원 발생을 우려한 보수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도 당장 아쉬운 측은 환경부 및 환경청 협조를 계속 구해야 하는 서울시 쪽이다. 시의 다른 공무원은 “한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별 상관없는 것까지 무조건 ‘일단 불허’ 통보가 오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강변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개발을 무조건 환경 파괴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생태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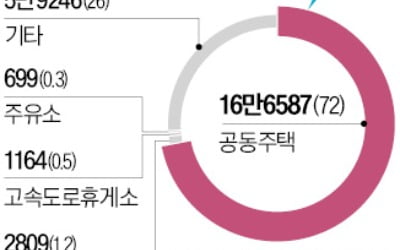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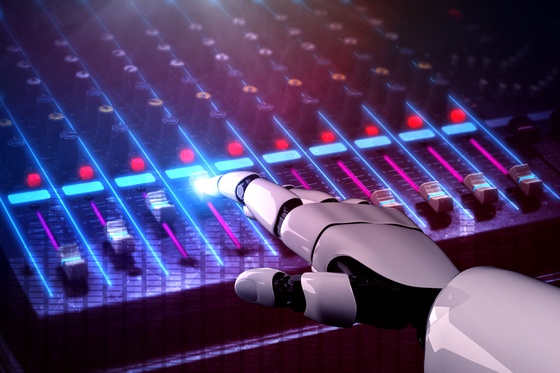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