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내재화가 어렵다면…완성차 "전기모터라도 생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텔란티스, 일본전산과 맞손
폭스바겐·현대차도 개발 나서
"부품社에 끌려다닐 수 없어"
폭스바겐·현대차도 개발 나서
"부품社에 끌려다닐 수 없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제조 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내재화가 어려워지자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인 모터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최근 전기모터 1위 업체인 일본전산과 올해부터 전기모터를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합작사를 세운 두 회사는 기존 디젤엔진 부품공장인 프랑스 트레메리 공장을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공장으로 전환해 모터를 생산한다. 2024년까지 모터 100만 개를 만들 계획이며,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전기차에 전기모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기업들은 자체 생산을 선호한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MEB)에 장착할 모터를 내년부터 최대 140만 개 생산하기로 했다. 포드는 영국 헤일우드 공장에 2억3000만파운드를 투자해 2024년부터 전기모터 등을 생산한다.
모터를 생산 중인 기업들도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우디는 최근 헝가리공장에 3억100만유로를 투자해 전기모터 생산량을 늘린다. BMW도 독일 공장에서 전기모터 생산량을 확대하고, 모터를 장착한 전기차 파워트레인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로부터 전기모터를 비롯한 모듈 시스템을 전량 조달하고 있다. 희토류를 쓰지 않는 구동 모터를 선행 개발해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들이 모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수평관계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배터리에 이어 모터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잃으면 소재·부품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내재화 움직임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모터는 배터리와 달리 내재화가 쉬운 분야이기도 하다. 투입해야 할 생산인력이 내연기관 엔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대다수 완성차업체가 주요 부품의 내재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모터 등 주요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최근 전기모터 1위 업체인 일본전산과 올해부터 전기모터를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합작사를 세운 두 회사는 기존 디젤엔진 부품공장인 프랑스 트레메리 공장을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공장으로 전환해 모터를 생산한다. 2024년까지 모터 100만 개를 만들 계획이며,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전기차에 전기모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기업들은 자체 생산을 선호한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MEB)에 장착할 모터를 내년부터 최대 140만 개 생산하기로 했다. 포드는 영국 헤일우드 공장에 2억3000만파운드를 투자해 2024년부터 전기모터 등을 생산한다.
모터를 생산 중인 기업들도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우디는 최근 헝가리공장에 3억100만유로를 투자해 전기모터 생산량을 늘린다. BMW도 독일 공장에서 전기모터 생산량을 확대하고, 모터를 장착한 전기차 파워트레인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로부터 전기모터를 비롯한 모듈 시스템을 전량 조달하고 있다. 희토류를 쓰지 않는 구동 모터를 선행 개발해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들이 모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수평관계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배터리에 이어 모터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잃으면 소재·부품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내재화 움직임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모터는 배터리와 달리 내재화가 쉬운 분야이기도 하다. 투입해야 할 생산인력이 내연기관 엔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대다수 완성차업체가 주요 부품의 내재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모터 등 주요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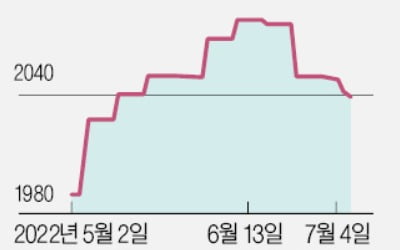
![[포토] 韓서 모인 현대車 글로벌 정비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A.30569033.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