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로 다시 불붙은 '전금법 개정 논란'
업무 관할 놓고 작년부터 갈등
한은 "이견 있는 부분 빼고 논의"
금융당국은 "반쪽 대책" 반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 우선 변제권 부여 △내부 거래에 대한 외부 청산 △고객별 하루 이용한도 신설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충전금이 외부 기관에 예치됐더라면 이번 ‘머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금융위 관리 감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현 상위 기관인 한은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입장 차로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다 머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너에 몰린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란 평가다. 한은은 한발 더 나아가 결제액의 외부 예치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현재 소비자송금액의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에 예치하도록 했으나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금융당국은 외부청산 등 주요 쟁점이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탁금을 외부 예치하면 ‘폰지 사기’ 범죄는 막을 수 있겠지만, 분식회계나 장부 실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장부 사본을 만들어 놓는 의무를 부여하고 개별 이용자의 환급 가능액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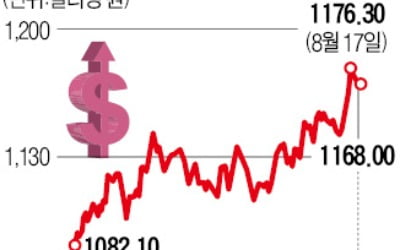
![1180원 돌파 앞두고 외환당국 개입…환율 7거래일 만에 내려[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2.22106460.3.jpg)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