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의 R까기] 돈독했던 이웃사촌, 하루아침에 등지게 한 부동산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지상정 보다 앞선 법, 결국 일상 파괴"
"문재인 대통령 사정보다 집주인 사정이 이해간다"
"문재인 대통령 사정보다 집주인 사정이 이해간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네 인심이 흉흉해졌다. 소소하게 애들 얘기 정도했던 동네 엄마들은 집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다. 그렇지 않아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일상인데, 주거불안까지 더해진 것이다.
아파트가 모여있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하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동네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슷한 지역에서 형제·자매들이 학교에 다니다보니 한두 다리를 건너 아는 경우가 다반사다. 외지인이 집주인인 경우에야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쩌겠냐' 싶지만, 뻔히 아는 사정에 실랑이를 하려니 결국 얼굴을 붉히고 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이사하기가 그나마 쉽다. 하지만 일단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장거리 이사가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자녀가 둘 이상인데다 전업주부인 경우라면 더 그렇다. 큰 아이와 막내까지 터울이 많게는 5~6년은 난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길게는 10년 넘게 일상을 공유하다보니 친구나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인생의 한 부분을 놓고 나오는 선택은 자녀들의 전학 이상으로 어려운 결정이다.
신도시에서는 지역을 떠나기 어렵다보니 처음에는 소형 아파트로 자가로 살아도 자녀들이 커가면서 큰 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는 게 흔한 풍경이다. 중·고교에 진학하거나 학원 등의 문제로 아파트 단지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내가 나왔던 집의 세입자는 자녀들이 다닌 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가족이다. 남일 같지 않으니 내 집의 세를 주는 계약을 할 때, 덕담같은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집이 조용하고 아늑해서 공부하기 좋아요", "광역버스 타기 좋고 아파트 관리 잘되서 살기 좋을 겁니다", "초등학생들 다니는 학원이랑 가까워요"….
이런 게 동네 인심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생각. 바로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네에서 인지상정은 통하지 않고, 속앓이하는 사정만 넘쳐나고 있다. 동네 아는 언니에서 냉혹한 집주인이 되는 건 한 순간이었다.

집값에 수도권으로 떠밀려온 세입자들의 설움은 더하다. 하남시에 사는 김모씨는 "돈 많으면 뭐가 걱정이냐. 서울에서 내집 있으면, 남편도 편하게 출퇴근하고 나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집값에 떠밀려 여기서 전세로 살림 시작하고 애들 키우면서 소소하게 살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전셋값이 급등한 경우다. 전셋값 상승없이 4년째 살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를 할 예정이다.
맘 카페에서 뿐만이 아니다. 동네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나오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엄마들이다. 용인 죽전동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솔직히 가진 것고 없고,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내 일상이 파괴되는 걸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정보다 집주인 언니의 사정이 이해가 간다. 누굴 원망하겠나 싶다"고 털어놨다.
집주인은 애들을 다 키우고 지방에 사업차 내려가면서 살던 집을 전세로 줬다. 장기 전셋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자금융통을 위해 전셋값을 올릴 예정이었다. 전셋값 인상없이 워낙 오래살던 집이여서 박씨도 올려주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새 세입자를 들이기로 했다.
노후된 아파트가 몰려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교육·쇼핑 등의 인프라가 좋은 1기 신도시에서는 몇 집 걸러 하나씩은 이러한 갈등이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신혼부부들이 사는 경우들이 많다. 집주인과 분쟁이 있어도 이사갈 집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매물이 없거나 높은 가격대다보니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
푸념은 사방에서 나온다. "동네 언니들이랑 브런치 먹으면서 애들 학교·학원 얘기하면서 일상적인 수다떨던 때가 그립다. 이제는 코로나19로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생전 안하던 집 얘기를 하다보면 우울한 감정이 올라온다."
집에는 삶이 있다. 내 집에 살건 남의 집에 살건 마찬가지다. 아픈 삶, 고단한 삶을 잠시라도 쉬게 해줄 안식처가 집이다. 하루 아침에 법으로 안식처를 뒤흔드는 걸 원하는 이는 없다. 일상을 뒤흔드는 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런지 모르겠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지상담병' 부동산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A.2339337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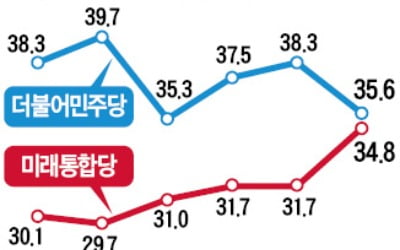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