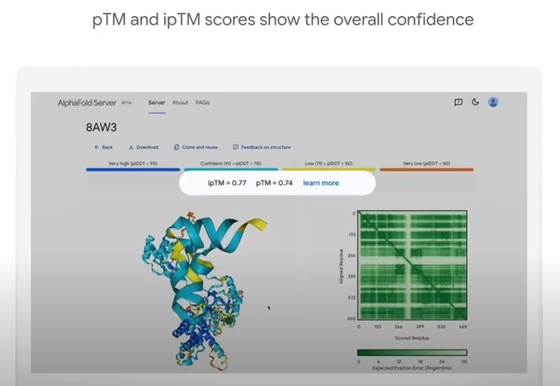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단독]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6일치 연차수당 주라니"
中企 '연차수당 부담가중' 한숨
2년차 휴가 안쓰고 퇴직하면
'1년차 11일+2년차 15일' 지급 부담
![[단독]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6일치 연차수당 주라니"](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19396.1.jpg)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작 1년 근무하고 떠나는 직원에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버금가는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엉터리 법이 어디 있냐”며 “중소기업들의 고용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럴 바엔 1년 미만 단기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주는 엉터리법”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다. 지난해 5월 시행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로 15일을 준다’고 규정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 시 1개월 개근 때 1일을 준다’고 했다. ‘2년차에 15일 발생하면 1년차에 사용한 휴가는 제외하고 준다’고 정했다. 따라서 2년차는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쓸 수 있다. 1년차 때 11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 때는 연차 휴가 일수가 4일밖에 남지 않는다.
새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1, 2년차 연차휴가를 분리 적용하다 보니 만 1년을 넘기면 새로 15일을 휴가로 쓸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든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적잖은 연차휴가 지급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2년차 근무자가 1년차 때 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1년차(11일)와 2년차(15일)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측에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 6월과 10월 등 1년에 두 번 연차 소진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1년차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 의지 꺾는다” 中企 불만
중소기업계에서는 2년차 근무자의 퇴직 문제가 골칫거리다. 단기 이직도 막아야 하지만 2년차 직원의 퇴직 후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추가로 26일치의 연차수당은 중소기업들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2년차 근무자의 퇴직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1년차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차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될 경우 1년차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뒤 퇴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차수당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노무담당자는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맞춰 휴가권을 활성화하려면 1년차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고용노동부 등에 2년차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연차수당 지급이 업계에 부담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