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벌레 캐릭터에 웃음 접목했더니 세계가 열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韓流의 숨은 주역들
(5) 넷플릭스에 '라바' 공급한 안병욱 감독
유튜브 등 통해 230개국 인기
넷플릭스가 공동제작 제안한 '라바 아일랜드'로 다시 돌풍
제작사 투바앤 매출 4배 급증
지재권 활용해 상품화 작업
장난감·문구·생활용품 선봬
제주에 '신화테마파크' 열어
(5) 넷플릭스에 '라바' 공급한 안병욱 감독
유튜브 등 통해 230개국 인기
넷플릭스가 공동제작 제안한 '라바 아일랜드'로 다시 돌풍
제작사 투바앤 매출 4배 급증
지재권 활용해 상품화 작업
장난감·문구·생활용품 선봬
제주에 '신화테마파크' 열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라바는 큰 사랑을 받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며 230개국에 퍼졌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업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자고 투바앤에 제안했다.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난 10월 ‘라바 아일랜드’ 시즌 1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소개됐다.
라바 아일랜드를 만든 안병욱 감독은 인기 비결에 대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캐릭터인 게 경쟁력”이라며 “애벌레란 소재 자체보다 솔직하고 재밌는 웃음을 주는 것에 더 집중했더니 해외 시장에서도 통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해외 겨냥 제작
라바 시리즈가 사랑받으며 투바앤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50억원이던 매출은 4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해 227억원에 달했다.
안 감독은 라바 시리즈 원작자인 맹주공 감독에 이어 캐릭터를 다양하게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가 제작한 라바 아일랜드는 뉴욕 하수구를 떠나 무인도에 불시착한 애벌레 ‘레드’와 ‘옐로우’의 좌충우돌 생존기를 그렸다. 내년 3월엔 넷플릭스에서 시즌 2도 선보인다.
라바 시리즈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됐다. “애니메이션엔 그 나라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바 시리즈는 처음부터 어느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일반 작품들과 달리 타깃 연령대도 다양하다. 라바는 처음엔 어른들을 위해 제작했다. 창작자들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레드와 옐로우는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사고도 종종 칩니다. 누구보다 감정에 솔직한 아이들이 이 캐릭터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IP 활용해 테마파크까지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정교한 수정 과정도 거쳤다. “레드가 옐로우를 이유 없이 때릴 때도 가끔 있었는데, 최대한 자제했어요. 또 서로 혀로 만지는 등 ‘애벌레’다운 설정을 많이 없애고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했죠.”
또 라바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인간 캐릭터 ‘척’도 넣었다. 투바앤 직원들과 함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상품화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장난감, 문구, 생활용품을 선보이고 지난해엔 제주도에 신화테마파크도 열었다. 라바뿐만 아니라 윙클베어, 로터리파크 등 투바앤 캐릭터들로 구성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IP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서 애니메이션업계 전체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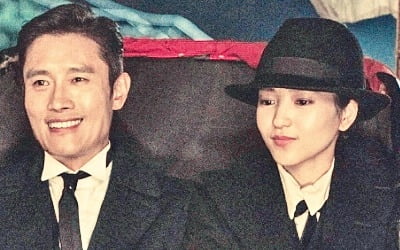

![[취재수첩] 동영상 전쟁에 뒤처진 제도 정비](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07.14242339.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