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파파 하이든’ 에게 배우는 소통
진정한 소통은 따뜻한 배려…서로를 세심히 이해해야
문철상 < 신협중앙회장 mcs@cu.co.kr >
![[한경에세이] ‘파파 하이든’ 에게 배우는 소통](https://img.hankyung.com/photo/201508/AA.10456017.1.jpg)
하이든 서거 200주년이던 2009년,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로 열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에선 매우 유쾌한 장면이 연출됐다. 고별 교향곡 연주 중 호른 주자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자리를 떠난다. 뒤이어 바이올린과 비올라, 오보에 등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무대에서 나간다. 당황한 모습의 지휘자는 마지막에 남은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을 쓰다듬고, 그들의 악보까지 직접 정성껏 챙겨준다. 하지만 이 두 사람마저 연주가 끝나자마자 지휘자만 혼자 두고 퇴장해 버린다. 관객들은 공연 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 곡엔 사연이 있다. ‘고별’을 작곡할 당시 하이든은 헝가리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전속 악단을 이끌고 있었다. 후작은 오스트리아 노이지들러 호수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을 본뜬 별궁을 짓고 그곳에 악단 단원들을 머물게 했는데, 1년이 넘도록 휴가를 주지 않았다. 단원들은 향수병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찼다.
당시 음악가들은 귀족의 후원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악단 책임자인 하이든은 후작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단원들이 휴가를 얻을 묘책을 떠올렸다. 그 결과물이 ‘고별’이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단원들이 한 명씩 나가는 모습을 본 에스테르하지 후작은 그제서야 단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하이든이 전하고자 한 뜻을 알았다. 그리고 유쾌하게 단원들의 휴가를 허락했다.
소통의 시작과 끝은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하이든은 후작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자 했고, 후작 또한 그에 화답한 것이다. 하이든은 평생 온화한 인품으로 윗사람이나 동료들과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 31년간 일한 악단에서도 단원들을 자식처럼 아껴 ‘파파 하이든’으로 불렸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언제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자기 주장으로만 목소리가 드높은 요즘, 자신의 의견 관철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세심히 살피는 건 어떨까. 이런 노력이 각자 인생의 금고에 쌓이면 불통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지 않을까.
문철상 < 신협중앙회장 mcs@cu.co.kr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74328.3.jpg)
![[시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 논제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285039.3.jpg)
![[천자칼럼] 보물선 인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59578.3.jpg)


![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첫 17,000선 돌파마감...엔비디아 7%↑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90642359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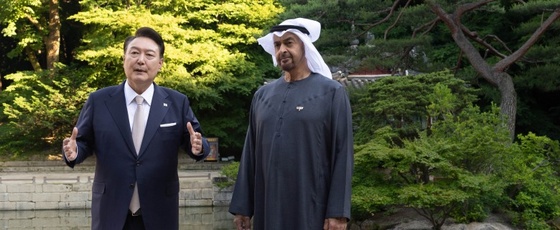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