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늘어나는 '공짜 점심'…중산층까지 탐하게 해선 안돼
稅收 부족에 법인세 인상 추진은 잘못
과세기반 늘리는 올바른 정책 방향 고수해야
"소득 순위가 중위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면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곽태원 <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
![[뉴스의 맥] 늘어나는 '공짜 점심'…중산층까지 탐하게 해선 안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895519.1.jpg)
![[뉴스의 맥] 늘어나는 '공짜 점심'…중산층까지 탐하게 해선 안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895520.1.jpg)
부가가치세율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좀 더 ‘뜸’이 들어야 거론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다.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소득세를 더 거두는 것이라고 본다.
세수 대책으로 소득세 증세를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 재정에서 소득세 역할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다. 소득세의 세율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별로 낮지 않지만 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터무니없이 작다. OECD 회원국 평균이 8.6%인데 한국은 3.7%(2013년)에 불과하다. 국제 비교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소득세 의존도를 좀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양극화나 분배의 악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대응은 소득세 강화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이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OECD 비해 소득세 비중 낮아
한국의 소득세율 구조는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진도도 상당히 높게 설계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비중이 작은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공제가 너무 큰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소득공제가 커지면서 면세점이 높아져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
명목세율은 선진국과 비슷해도 평균세율은 현저히 낮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공제가 커지면 설계된 것보다 누진도가 약해진다. 고소득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소득공제로 줄어들면 높은 한계세율 때문에 감세액이 늘어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45.7%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까지 반영하면 이 비율은 48%로 높아진다고 한다.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05년 52.9%에서 꾸준히 줄어 2013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성과였다. 면세자 비율 수치가 이 정도만 돼도 한결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연말정산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니까 오류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지만 이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 가지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액공제율을 소득세의 최저세율인 6%보다 훨씬 높은 12% 또는 15%로 했다는 점이다. 이것 때문에 하단(저소득) 쪽 근로자의 세부담이 세법 개정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내던 사람 중 세금을 내지 않게 된 사람의 수가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일자리 사정 악화로 파트타임 근로자 등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버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면 이것도 면세자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소득자 稅부담 줄어 면세자 증가
그러나 이 비율이 높아져도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일부 조정한 것도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납세자 수는 줄었어도 금액으로 본 소득세의 베이스가 늘어났거나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완대책으로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면 면세자 비중이 더 커질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세부담까지 줄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조금 더 약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비과세 감면을 가능한 한 줄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써 소득세를 합리화하고 강화하겠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도 예기치 못한 연말정산 파동에 면세자 비중이 커진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더 큰 아쉬움은 개인의 기본 세목인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 가능한 한 줄여야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구를 자주 사용한다. 어떤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려면 ‘공짜 도시락’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배달되도록 정책이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세가 또 다른 무상급식 도시락이 돼 중산층까지 이것을 탐한다면 그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
소득 순위가 근로자의 50%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 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나마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가질 수 없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중위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순위가 중위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현상을 납세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유권자 눈치 보기에 바쁜 소신 없는 정치권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공짜점심 티켓’을 남발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곽태원 <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커피 400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취재수첩] 반포 사업장으로 본 PF '옥석 가리기' 환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722866.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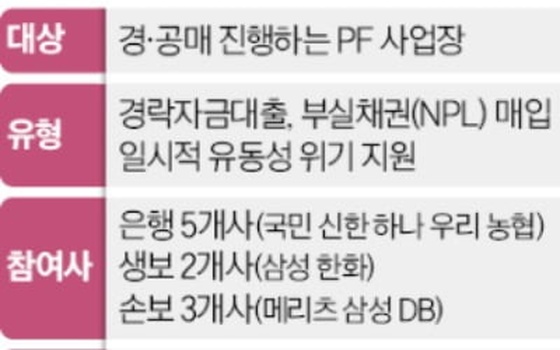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22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