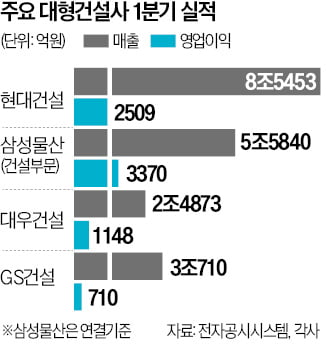[임대시장 ABC] '월세 주택' 확대는 대세…집주인도 사업가 마인드 갖춰야
금리가 높을 때는 임대인에게 전세금은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매입하려는 돈이 부족할 경우 내집 마련의 전 단계인 전세로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윈윈 조건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전세 비율은 높아졌다. 1975년 17.3%이던 전세 비율은 1980년 23.9%에서 1990년에는 27.8%까지 상승했다.
높아지던 전세 비율의 곡선이 꺾이기 시작한 변곡점은 금리하향 곡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금융회사에 맡겨도 이자소득을 기대하기는커녕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서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이제는 하우스푸어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금리 하향세에다 더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꼬박꼬박 받겠다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서 보증부 월세 비율은 2011년 1월 22%에서 지난 7월 39.6%로 급증했다. 2년 반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치솟는 전셋값 부담에 보증부 월세로 갈아탄 임차인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알투코리아의 김희선 전무는 “부동산 시장의 패턴이 바뀌면서 보증부 월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인들도 스스로 사업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지가 뛰어나고 건물관리가 좋은 조건을 따져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주택 임대시장도 비즈니스 영역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