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냉동인간은 숨이 끊어진 시신이다. 하지만 소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최초의 냉동인간은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다. 1967년 간암으로 죽기 직전 인공혈액을 몸속에 넣고 액체질소로 채워진 강철기구 속으로 들어갔다. 암이 정복될 때 그의 몸은 해동돼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제거한 뒤 긴 잠에서 깨어나기로 돼 있다. 딱한 건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냉동상태로 모시느라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한다.
냉동과정은 까다롭다. 전신마취 후 심장에 항응고제를 주입해 피가 굳는 것을 방지하는 게 첫 단계다. 체온을 떨어뜨려 세포 괴사를 막고 전신에서 혈액을 뽑아낸 다음 특수용액을 넣는다. 이어 영하 196℃의 액체질소 속에 보존하게 된다. 현재 냉동인간은 미국 러시아 등에 200명쯤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도 1000명을 넘는다. 이들이 언제 깨어날지는 기약이 없다. 아직은 인체 일부를 냉동했다가 녹이는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 특히 기억력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숙제다.
KAIST 이정용·육종민 박사 연구팀이 액체 속에 녹아 있는 각종 물질의 원자를 관찰하는 기술을 처음 개발해 냉동인간 소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해동과정에서 세포를 파괴하는 주요인인 재결정(녹았다가 다시 어는 현상)을 방지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멜 깁슨 주연의 영화 ‘포에버 영’에서 주인공은 59년 후 냉동상태에서 깨어난다. 실제로 냉동됐다가 소생하는 첫 인간은 2045년께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깨어난다 해도 기억이 몽땅 지워진다면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같은 윤리적 문제도 생긴다.
어떻든 냉동인간에는 영생을 찾으려는 인간의 꿈이 반영돼 있다. 진시황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다. 과학의 발달이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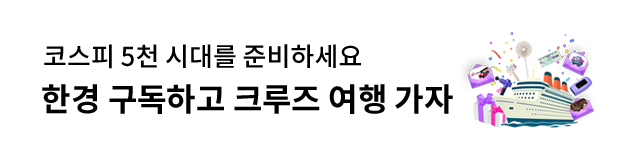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기고] AI 시대는 K반도체 도약의 기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713989.3.jpg)
![[한경에세이] 일이 안 풀릴 때 나는 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2357927.3.jpg)
![[시론] 이상에 치우친 철강 탄소중립](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547557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