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는 '희소성'…한국 맞춤 전략 짤 것"
품질·완성도 높이기 위해 1년에 5000개만 제작
2000만원대 엔트리 라인 출시

1년에 딱 5000개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명품시계업체 ‘파르미지아니 플레리어’의 장 마크 자코 비즈니스 최고경영자(CEO·63·사진).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시계박람회(SIHH)에서 만난 그는 “엔트리 라인(합리적 가격대로 접근성을 높인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타깃 고객층이 달라진 게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퍼페추얼 캘린더(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달력 기능)보다 한 단계 아래인 애뉴얼 캘린더를 장착한 ‘레트로그레이드 애뉴얼 캘린더’(3900만원대) 등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았다.
자코 대표는 블로바 까르띠에 오메가 에벨 휴고보스 등 시계 브랜드를 두루 거친 뒤 2000년부터 파르미지아니의 CEO를 맡고 있다.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디자이너로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자코 대표는 경영과 마케팅을 총괄한다. 그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증가율은 19%였다”며 “홍콩 등 아시아의 성장폭이 컸고 이탈리아 독일 미국 러시아에 매장을 새로 연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파르미지아니는 올 상반기엔 영국과 브라질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희소성’을 찾는 우량고객을 위해서다.

엔트리 라인도 1800만~2000만원대로 고가인 편이다. 자코 대표는 “럭셔리 브랜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계를 차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고객에게 ‘에브리데이 워치’를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엔트리급을 넓혔다”고 했다. SIHH에서 리치몬트그룹 소속이 아닌 파르미지아니를 전시회에 참가시킨 것도 기술력과 품질,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서다.
그는 한국시장에 대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삶의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시장”이라며 “단순 과시용이 아닌 자부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있는 데 돈을 쓰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자코 대표는 “앞으로는 가치소비를 하는 수요에 어울리는 제품과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르미지아니는 시계 복원가였던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1975년 ‘시간 예술로의 여행’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계다. 주문제작 시계였던 파르미지아니는 1996년 거대 제약그룹 산도즈 재단의 후원을 받아 ‘파르미지아니 플레리어’라는 독자 브랜드로 재탄생했다. 시계의 핵심인 무브먼트(동력장치)와 다이얼(문자판) 핸즈(시계바늘) 헤어스프링(밸런스휠 부품) 등의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국내에는 내달 중 서울 청담동의 명품시계 멀티숍 ‘노블워치’에 첫 매장을 낼 예정이다.
제네바=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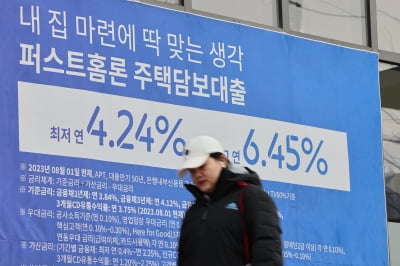
!["작다고 얕보지 마"…확 바꿔 돌아온 BMW 쿠페형 SUV 'X2'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44054.3.jpg)



![AI 성장 여력 남았나…엔비디아, 실적에 숨죽인 시장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3160729554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