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버티기...사퇴...'13일간의 드라마'
지난달 3일 내정발표를 앞두고 벌어졌던 '야단법석'까지 포함하면 한 달이다.
내정 단계에선 야당보다 여당이 먼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를 다시 요직에 맡기는 것은 민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지만 이른바 '왕의 남자'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는 이내 당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당 지도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아직은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논란 끝에 김 부총리는 지난달 3일 교육부총리에 내정됐다.
막상 결정이 나고나자 여당의원들은 이상하리만큼 목소리를 낮췄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부총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안정될 것 같았던 '김병준 부총리 체제'는 국민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취임 4일 만인 지난달 24일 언론에 보도된 이후 흔들렸다.
여당은 논문 표절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땐 김 부총리를 적극 옹호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의 사퇴 거부의사는 강했다.
여당의 사퇴요구에 오히려 국회청문회 개최 요구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의 중재노력이 돋보였다.
결국 지난달 31일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오찬회동,한 총리와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심야회의를 거쳐 자진사퇴쪽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1일 국회 교육위가 끝나고 김 부총리는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반발하고 청와대측이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유임론이 제기되는 등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2일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오랜 진퇴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경제 좋아진다는데 체감은…" 尹 부정평가 이유 '1위'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21914.3.jpg)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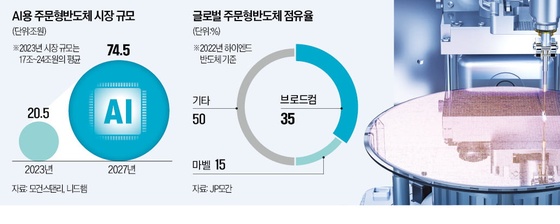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