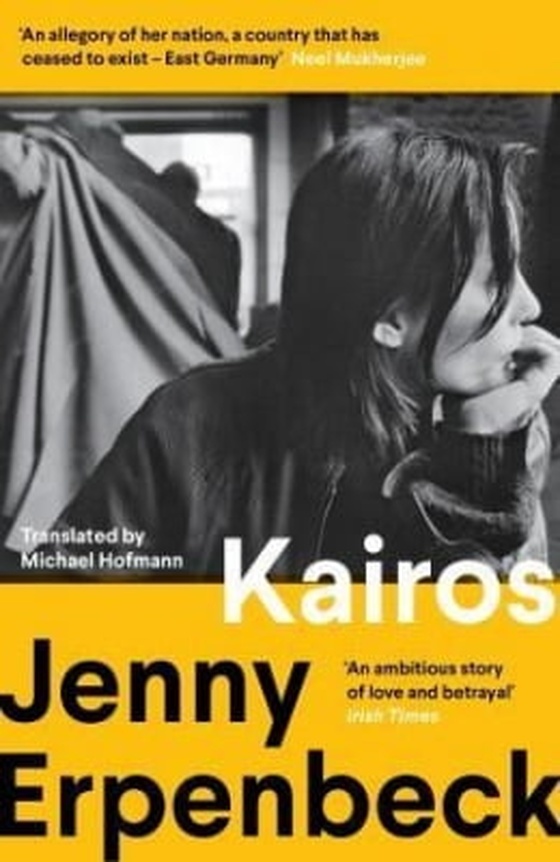입력2006.04.08 16:43
수정2006.04.08 20:16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한명숙(韓明淑) 카드'를 빼 들었다.
`정치적 분위기'가 노 대통령의 선택에 크게 작용했다.
그만큼 여권의 마음이 바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 여권은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흠 잡힐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는 `걸리면 죽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최연희(崔鉛熙) 의원이나,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건은 두말할 나위 없고, 말꼬투리가 잡히거나,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사생결단으로 달라 붙고 있다.
선거 탓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노 대통령이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대신에 한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공세의 빌미를 주는 것은 자기무덤을 파는 겪"이라며 "첫 여성총리라는 상징성과 무난함을 갖춘 한 의원으로 여권의 최종 판단이 모아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권의 판단' 부분이다.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이 고심속에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인사의 첫 단추는 열린우리당에서 뀄다.
꼭 집어서 말하면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역할이 컸다.
그는 이 전 총리의 사의 수용 단계인 지난 14일 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이미 한 의원을 1순위 후보로 천거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리 달가워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인사권자에 대한 무례'를 저지른 정 의장에 대한 반감도 내부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한때 한 의원 카드가 뒤집힐 뻔 하기도 했다.
이 때 앞장선 것이 당내 여성 의원들과 핵심 당직자들이다.
심지어 여성 의원들은 23일 모임을 갖고 정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에 `반드시 한명숙이 돼야 하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며 압박했다.
모양은 당 지도부 압박이지만 실제로는 정 의장 힘실어주기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여권내에서는 이 전 총리의 사퇴 또한 정 의장의 드라이브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 의장이 국무총리의 `임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정 의장의 이 같은 힘의 원천은 여권이 지상목표로 내건 지방선거 승리에 있다.
2.18 전당대회 이후 당의 분위기를 일사분란하게 몰아갈 수 있었던 것도, 노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설득할 수 있었던 명분도 모두 그 것이다.
정 의장은 최소한 지방선거때까지는,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여권내 확고부동한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정국은 여권이나 정 의장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 하다.
`최연희 성추행 파문'과 `이명박 황제테니스 논란'이라는 대형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나라당이 수세탈출의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에게 이번 총리 지명은 그다지 호재랄 수는 없다.
성추행 파문의 덫에 걸려 있는 한나라당이 한 의원의 당적 문제나 다른 사유를 이유로 첫 여성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의원이 돌연 `당적'을 버릴 개연성도 꽤 높은 상황이다.
닭좇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민노당 등 소야(小野)가 한 의원 지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선 것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하지만 청문회는 당적 이탈과 별개로 주요 변수다.
이미 선거 중립을 이유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 등의 사퇴를 요구해온 한나라당은 한 의원의 당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또 다른 `부적격' 사유를 찾을 공산이 크다.
또한 우리 국회 청문회의 `상처내기' 전통과 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청문회가 실시된다는 시의성 등으로 인해 `총리인준 정국'은 시끄러워질 개연성이 높다.
한때 여권 일각에서 "누가 돼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꼬투리 잡기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후임 총리 인선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정책 연속성의 차질을 일정부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를 앞둔 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이번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지방선거 정국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

![[포토] '우크라 아동그림전'…단독 일정 재개한 김건희 여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87805.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