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남은 2년-이것만은 풀고 가자] (1) 재정적자와 나라빚
특히 경제운용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념 논쟁과 정책 혼선 속에 기업은 의욕을 잃고 해외로 발길을 돌렸고,국민들은 좀처럼 펴지지 않는 가계살림과 취업난에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 정부는 '코드'에 맞는 정책을 양산해 내느라 산적한 경제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새 일을 도모하기보다는,이미 벌여놓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남은 경제부문 과제를 짚어보고,해결책을 제시해보려 한다.
'세수는 줄고,지출과 빚은 늘어가고…'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재정적자 해소가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나라 빚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여건은 악화되고,지출요인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과다한 국가채무는 저투자→저생산→저성장→저소득→저소비→저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경제를 옥죄오는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증가의 심각성은 그 일관된 추세와 빠른 속도에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적자재정을 펴왔고,때문에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었던 나라 빚(정부 발표치 기준)은 3년 만에 248조1000억원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면 1인당 514만원쯤 되는 빚이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세수(일반회계)의 6.6%(9조2000억원)를 투입했을 정도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해 걱정들을 한다지만 경제성장률이나 세수환경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내외와 30% 선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통제가능한 수준"(방문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2004년에는 '2008년에 가면 균형예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해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목표연도를 2009년 이후로 미뤄놨다"며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망하는 향후 4~5% 성장을 낙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예상치 못하던 사회안전망 및 대북관련 지출이 생긴다면 균형재정 전망 자체가 의미 없게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정부가 지금처럼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 억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와 학계는 200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4%에 그친 반면,지출증가율(일반회계 기준)은 9.0%에 달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지출을 경제성장률 예상치 한도 내에서 묶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재정적자에 대한 논란에 이념적인 시각을 들이대고 있어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가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복지나 국방분야 등에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수를 늘리고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야 하는데,그럴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사전 정지작업 없이 지출만 늘리고 있어 재정적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향후 경제의 엄청난 부채부담을 해소하려면 '덜 걷어 덜 쓰든''더 걷어 더 쓰든'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재정을 이뤄야 한다.
더 걷는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희생을,덜 쓴다는 것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희생이 담보돼 있는 정책에 국민적 합의는 배제된 채 정부의 독단만 남아 있다면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부모님 모시고 '1박 30만원' 호캉스 갔다가…당황스럽네요"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6285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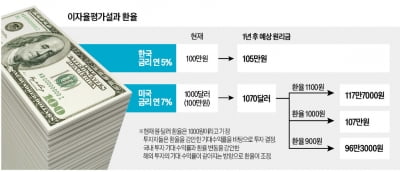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