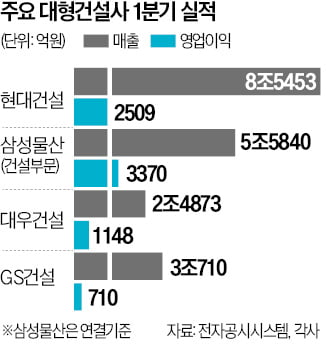입력2006.04.02 17:28
수정2006.04.02 17:31
지난해 부동산 경매시장에 본격 도입된 기간입찰제가 제도 시행 4개월이 넘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시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각 법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서다.
기간입찰제는 당일 접수를 받아 경매를 실시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일정기간을 정해 두고 등기우편이나 직접 입찰서를 받아 응찰 후 입찰함을 법원으로 옮겨 함을 개봉,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매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경매 브로커도 상당부분 사리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17일 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간입찰제가 도입된 작년 9월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입찰에 부쳐진 물건은 경남 창원지방법원 1건과 서울서부지방법원 11건 등 모두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기간입찰제 첫 사례로 기록됐던 창원지법 경매5계의 물건은 한 회사의 직원용 임대아파트 2백가구가 통째로 나온 특수한 경우여서 일반 개인을 위한 물건은 지난달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부지원의 11건이 처음이다.
나머지 법원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가 맡고 있는 1건 말고는 현재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기간입찰제 시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제도 시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기간입찰제의 적용을 받는 물건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는 담당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다보니 기일입찰제에 비해 일거리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기간입찰제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불황으로 경매물건이 급증해 경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간입찰제까지 실시할 경우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기일입찰제 물건과 기간입찰제 물건에 대해 공고를 따로 내야 하는 것도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도 기간입찰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마다 입찰 양식이 달라 입찰표를 구하기 위해 미리 해당 법원을 찾아야 하고 정해진 입찰기간 이후 매각기일에 결과를 보기 위해 해당 법정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한 경매 전문가는 "기간입찰제를 도입한 취지는 좋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