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3:16
수정2006.04.04 03:20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
기업을 공개해 증시에 상장(등록)해도 자금 조달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서 이렇다 할 실익이 없는 반면 과도한 경영 투명성에다 주가 관리 등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높아 경영 부담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反)기업 정서가 거세지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상장 이후 주식관련 업무가 더 늘어난다는 점도 장외 우량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간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장외 우량 기업들 가운데 상장(등록) 계획을 아예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조7천억원의 매출에 2천5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장외기업 중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업공개 계획 자체가 없다.
회사 관계자는 "굳이 증시에 상장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1조원대의 매출을 올린 SK건설과 롯데건설도 상장을 꺼리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건설은 특히 위험 업종으로 분류돼 상장 이후 기업 이미지나 주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가 대주주이거나 합작회사인 업체들도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
국내 비상장사 중 시가총액 1위인 LG칼텍스정유는 대주주인 셰브론 텍사코의 반대로 연내 상장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외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상장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경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소액주주와 시민단체 등의 경영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티스LG는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며 아예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쪽을 택했다.
중소기업들의 기업공개 기피는 훨씬 심각하다.
증시 관련 업무를 맡을 인력을 두기도 버거운 데다 주가조작 시비 등이 불거질 때마다 근거없이 휩쓸려 들어가 기업 이미지에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닥 등록 심사를 청구하는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등록심사 청구 기업은 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백27개)의 26.8%에 불과하다.
지난 2001년 1∼8월(2백70개)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김철수·정종태 기자 kcso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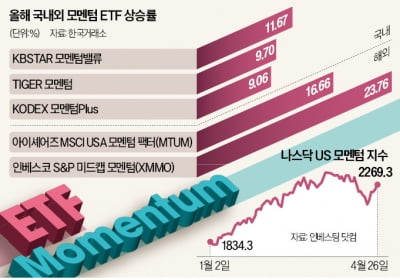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