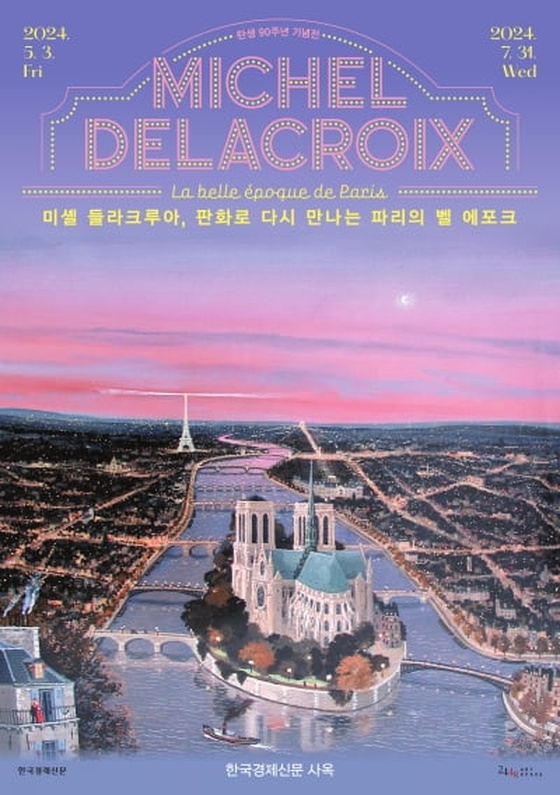올 노사관계 악영향 우려 .. 한전 쟁의, 배경/전망
국내 "노동조합 1호"로 지난 46년11월 출범된 한전노조가 49년만에 처음
쟁의발생신고를 낸 것은 이유야 어쨋든 올 노사동향에 좋지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지난 80년 국보위때 강제 삭감된 퇴직급여기준을 원상회복하느냐 여부가
그 골간이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한전노조측은 원상회복의 방안으로 일부수당의 기본급편입과 장기근속수당
인상등으로 풀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퇴직급여기준 자체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게 법원판례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사측, 더 정확히 말해 정부측은 이런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대상자가 무려 1만5천6백여명에 달해 이들의 퇴직금을 보상해 주려면
1조4천억원의 거액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파로 다른 기업들에서
까지 대폭 임금인상요구가 잇따를 것을 내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지난해 11월 한전사측이 <>기본급 4%인상 <>시간외수당을 실적대로 지급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장기근속보로금 신설등에 잠정 합의해 놓고도
막판에 "서명"을 거부했던 것도 이런 사정에서였다.
정부측에서 "절대 수용불가"라는 사인을 강하게 전달했기 때문이란 후문
이다.
노조입장에서 보면 "약속위반"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더구나 퇴직금 보상문제는 현 한전노조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 90년4월이후
만5년째 끌어온 사안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전노조의 쟁의발생신고서가 지난3일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만큼 "15일의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노사간 막후 협상에 따라
원만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간 끌어온 사안이 단 보름의 기일내에 돌파구를 찾게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물론 냉각기간내 타결이 안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파업등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르면 전기 가스등 공익사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용인되지 않으며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정부가 임명하는 조정알선
위원의 직권중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돼 있다.
결국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정부측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이번
쟁의의 고리룰 푸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전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보면 딱부러진 절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통산부측은 "이미 법원 판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안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라며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전면 수용거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올 노사동향과 관련, 대형 공기업에서의 임금관련
분규를 가장 우려해 왔다.
노총이 매년 경총과 합의하에 결정해 온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거부키로 함에 따라 그 파장이 당장 공기업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그 여파가 일반 민간기업들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는 평지돌출식 임금인상 요구가 아니라 국보위때 강제
삭감된 퇴직금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초부터 터져나온 한전쟁의사태가 올 노사관계 전반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매김 될 것인지, "찻잔속 태풍"으로 끝날지 "공"은 정부쪽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교육부 차관 "증원된 의대 32곳 중 12곳 학칙 개정 완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철자도 몰랐던 기업으로 6배…월가 전설 "엔비디아 팔았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80805117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