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쇼크' 1년] 정부 '허둥지둥' 1년…'무늬만 알파고' 정책 양산
2012년 기본계획 '재탕'
AI로 어획량 예측 추진
빅데이터 조차 마련 안돼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핵심법안 국회에 발 묶여
![['알파고 쇼크' 1년] 정부 '허둥지둥' 1년…'무늬만 알파고' 정책 양산](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72671.1.jpg)
◆‘알파道’로 이름만 바꾼 C-ITS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035년까지 AI 도로 시대를 열겠다”며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도입하고 2035년까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런데 C-ITS는 이미 2012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난해 7월 시범 사업인 대전~세종 간 도로도 설치됐다. 한 도로교통 전문가는 “5년 전부터 계획한 국가사업이 갑자기 AI 정책으로 둔갑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AI를 어획량 예측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벽에 부딪혔다. 예측에 사용되는 해수 온도와 해양 기후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AI 기술 도입은커녕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최순실에 발목 잡힌 AI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소유의 강원 평창지역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유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법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AI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알파고에 맞설 한국형 AI를 확보하겠다며 대기업들에서 210억원의 출자를 받아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 인사가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정부가 나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에서 돈을 거둬 만든 관제연구소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부처 엇박자 여전
국내 병원들이 IBM 왓슨 등 의료 AI 진단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달 말에야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의료 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내 의료장비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허가 심사에 활용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은 정작 지난해 이후에야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전략’ 시안을 내놨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혁신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 정책의 근거가 될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올해 1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일자리 전망 따로 교육정책 따로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둥지둥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정부가 민간과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AI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총무성과 문부과학성, 일본경제산업성으로 추진 주체를 분명히 밝혔다. 독일은 제조분야와 공공 교통분야 AI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케이스 마줄로 미국 메릴랜드대 정보대학장은 “미국은 AI 제품과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공공 영역에서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태/이호기 기자 kunt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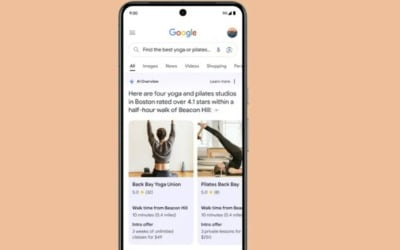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에 사상최고...3대지수도 나란히 상승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206314047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