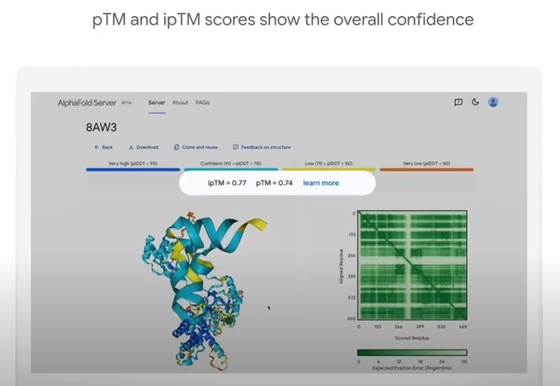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서화동의 데스크 시각] 왜 유진룡뿐인가
![[서화동의 데스크 시각] 왜 유진룡뿐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02.6931840.1.jpg)
문체부는 국정 농단의 주 무대였다. 덕분에 문체부 고위 간부들은 요즘 특검에 불려다니기 바쁘다. 지난해 10월 문체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필두로 김종 전 차관은 구속됐고, 김희범 정관주 전 차관과 송수근 유동훈 1차관이 특검에 소환됐다. 8일엔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조윤선 장관도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수립과 함께 공보처로 시작해 공보부, 문공부, 문화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온 문체부가 이토록 뉴스의 초점이 된 적이 있었던가.
진실 밝혀져야 후유증 줄어
“누가 속 시원히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체부의 한 실무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거들었든, 시키니까 마지못해 했든 조직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똑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였다. 그렇다 보니 조직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알 것 같은데…’라며 의심하는 분위기마저 감돈다고 했다.
뒷감당을 생각하면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연루됐을 경우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야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의혹과 후유증은 커진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국정 농단의 실태를 이야기한 사람은 유진룡 전 장관이 거의 유일하다. 2014년 7월 물러난 유 전 장관은 문체부 1급 실·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 인사, 블랙리스트의 실체 등을 잇달아 폭로했다. 그는 “정치집단은 항상 공무원을 흔들려고 하지만 단언컨대 90% 이상의 공무원은 양심적”이라며 “이들이 양심적으로 일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백안시하지 않는 풍토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악에 물들지 않는 길
문체부는 지난 6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문예위원을 투명하게 추천해 임명하고, 심의위원은 풀제·추첨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던 문학주간, 원로연극제, 창작음악극 지원 등은 장르별 협회·단체로 사업을 넘기기로 했다.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체부의 건강성 회복이다. 거창하게 사명감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약간의 양심만 있으면 될 문제다. 국정 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을 싸잡아 ‘부역자’로 몰아붙이는 데는 반대한다. 하지만 알면서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부역하는 행위다. 이른바 ‘악의 평범성’은 그렇게 형성된다.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은 악에 끌려다니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서화동 문화부장 fire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람경영, 욕망이 시장이다 [한경에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60695.3.jpg)
![[한경에세이] 노키즈존 500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조일훈 칼럼] 왜 멀쩡한 국민을 남의 돈 넘보게 만드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383340.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