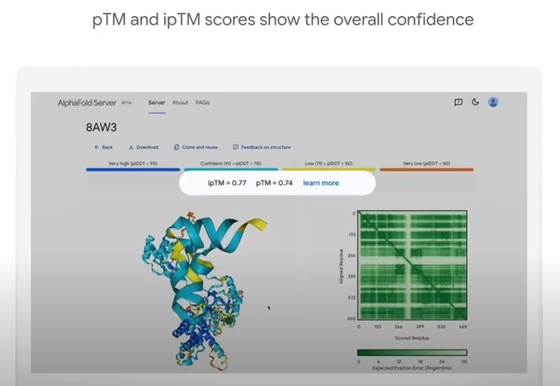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사설] 주택공급 줄이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정부
올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23조6000억원 늘어난 것은 ‘집단대출’ 때문이다. 아파트분양 때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해 빌려주는 이 중도금 대출이 증가분의 49%를 차지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계대출의 억제 강도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팽팽히 맞섰던 것도 집단대출의 직접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였다고 한다. 결국 집단대출은 보증 한도를 소폭 조정하는 등의 미온적인 감축에 그쳤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국토부 반대로 제외됐다. 대신 주택 신규공급을 줄여 그것에 따르는 대출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 되고 말았다.
가계부채를 잡자니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판이고, 부동산시장을 걱정하다 보니 가계빚은 제어되지 않은 채 불어난다. 더구나 초저금리라는 근본 요인은 정부도 당장 어쩔 수가 없다. 지난 2월, 소득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하는 주택대출 억제책을 내놨으나 가계대출은 비(非)은행권으로 확장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질까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2014년 최경환 경제팀은 LTV·DTI 등 대출규제를 풀며 공급촉진에 나섰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건설업계는 즉각 화답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은 늘 정부에 유혹적이다. 지금에 와서 가계빚 출구대책을 찾자니 최악의 소비심리(2분기 소비성향 70.9%)가 겁나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경기대책에 묘수가 있을 수 없다. 끝없는 기술혁신, 중단 없는 규제혁파, 감세로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길뿐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시론] 韓 수출 위협하는 슈퍼 엔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1180953.3.jpg)
![[천자칼럼] 외국 의사 수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666813.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