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대통령 방일 등 대일외교 정상화에 나설 때다
멀어질 대로 멀어진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과 의지가 읽힌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지난 주말 일본의 ‘위안부 기금 10억엔’ 신속 출연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취임 4년이 되도록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박 대통령으로선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친중경사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던 한국 외교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3년여 공들인 ‘친중 외교’에도 북핵, 사드 등의 현안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은 오히려 굵은 팔뚝을 내보이며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친중외교는 사활적인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원심력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고 하겠다. 느슨해진 한·일 관계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발전한 김정은의 핵도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친중외교는 균형외교로 전환돼야 하고 대일외교의 복원이 그 핵심 과제다. 복잡한 과거사에 미래를 저당잡히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12·28 합의’에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인정했다. 최근 합의안 실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한층 확실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우리로서는 불만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민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보완해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양국의 일부 과격 단체의 무책임한 주장에 더는 휩쓸려서는 안 된다.
물론 일본이 제국주의적 향수로 빠져든다면 엄중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 관계에 감정과 도덕만을 앞세워선 곤란하다. 안보 통일 경제 등 우리 핵심현안을 해결하는 데 일본은 엄연한 상수다. 대일외교 정상화에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의 방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커피 400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취재수첩] 반포 사업장으로 본 PF '옥석 가리기' 환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722866.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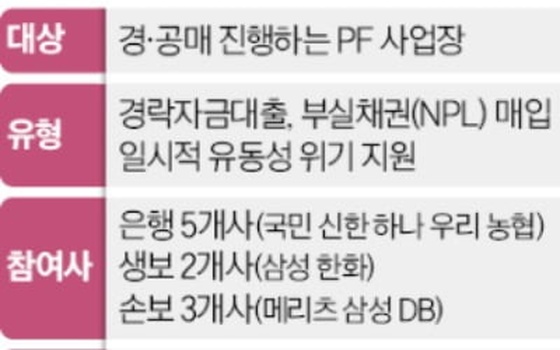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31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