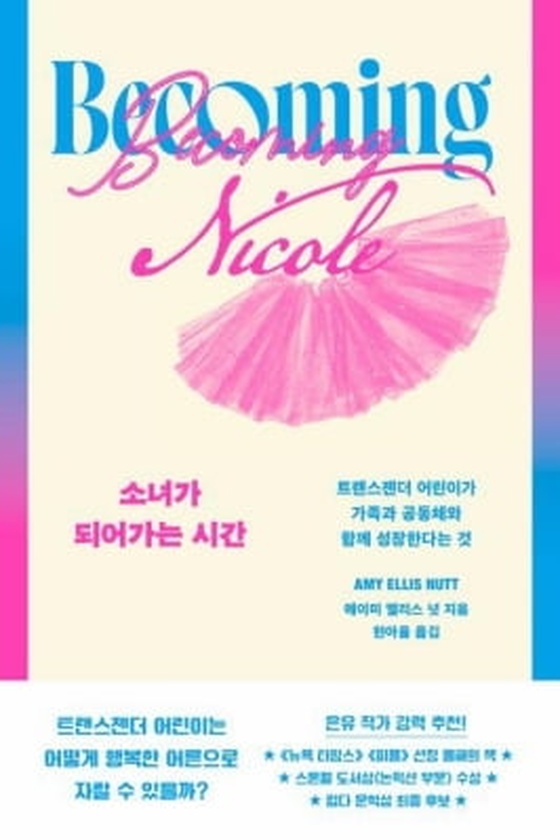85㎡ 이하만 지어선 남는게 없는데…건설사·조합 '고민'
고덕 2단지 시공사 선정
메이저 건설사 대거 불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들이 중소형을 선호하면서 건설사와 조합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형을 줄이고 중소형으로 단지를 구성하면 일반분양에서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서다. 중소형의 분양가격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형에 비하면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접수 때 메이저 건설사들이 불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형 평형의 가치가 하락해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전 중소형을 요구하는 게 대세”라며 “설계 변경을 통해 전반적으로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건설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분양가가 시공원가 수준인 조합원 분양에서는 손해를 보고 일반분양에서 이익을 내 사업성을 맞춰왔다”며 “최근 조합원들이 중소형을 선호하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져 정비사업 수주 심의를 깐깐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무작정 중소형을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합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단지 구성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또 설계상 중대형도 일정 부분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 D건설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설계기술상 일정 부분 대형과 중소형이 섞일 수밖에 없다”며 “네모 반듯한 택지지구가 아니라면 분양성이 좋은 85㎡짜리 집만 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공공관리제 때문에 건설사가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단지 구성과 평면 설계, 가구 수 조정에 간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철자도 몰랐던 기업으로 6배…월가 전설 "엔비디아 팔았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80805117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