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더 올릴 준비돼있다는 美 파월, 한국도 인상요인 쌓이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로써 9·11월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최소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고금리 문턱에서 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국은행 입장이 계속 어렵게 됐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돼 미국이 2%포인트나 더 높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환율,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가중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우려점이다.
‘파월 발언’ 하루 전 한은이 올 들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놓은 배경 설명에도 이런 고민은 대략 들어 있다. 이창용 총재의 당시 기자브리핑을 돌아보면 ‘빚투’, ‘영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요컨대 지난 10여 년처럼 연 1~2%대 저금리가 지금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은도 여차하면 연 3.5%인 기준금리를 3.75% 정도로 올릴 채비가 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본인 책임 아래 쓸 수 있는 금리(인상) 카드는 접어둔 채 슬금슬금 오른 집값에 우려만 한 이 총재 식의 ‘부동산 구두개입’이 적절한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금리 인상 요인이 쌓여가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도 고물가가 여전하다. 정부도 민간도 적절한 긴축이 불가피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나 한계 산업과 부실기업의 퇴로 등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누구라도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준이라는 가계빚 증가에 제동이 필요하고, 물가와 환율 안정도 중요하다. 한은이 주저주저하며 계속 좌고우면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들도 미리 금리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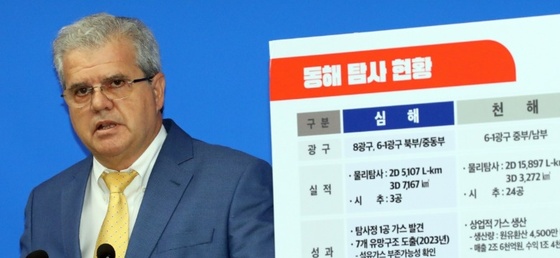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