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정장애'에 빠진 정부, 비판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세 개편이 자꾸 꼬이는 것은 그 자체가 한꺼번에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국산 맥주의 역차별 해소, 소줏값 인상 불가, 경쟁을 통한 고급화 유도 등 지향 목표가 모두 제약요인인 셈이다. 또 종량세에 따라 ‘리터당 OOO원’식으로 세금이 고정되면 술값이 인상돼도 세수가 늘지 않고, 세금 인상 시 매번 세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결단을 미룰수록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쉽사리 통과시켜 줄지 의문이다.
정부의 ‘결정 장애’는 이뿐이 아니다. 책임져야 할 결정을 기피하고 사회적 합의를 명분삼아 위원회로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현행 유지’를 포함한 사지선다로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던져둔 채 아무 진전이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경사노위로 넘겼지만 갈등을 키우고 시간만 허비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 대입제도 개편안은 다음 정권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기상천외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은 불리할 수 있다. 최선의 대안을 찾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게 정부 역할이자 의무다. 논란이 많다고 정부가 마냥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정책당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을 감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용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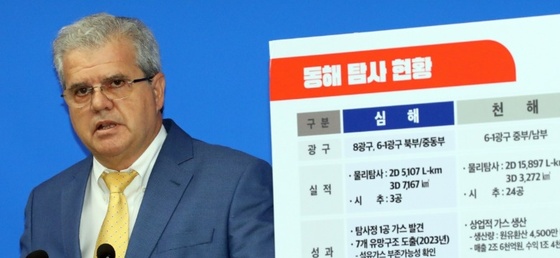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