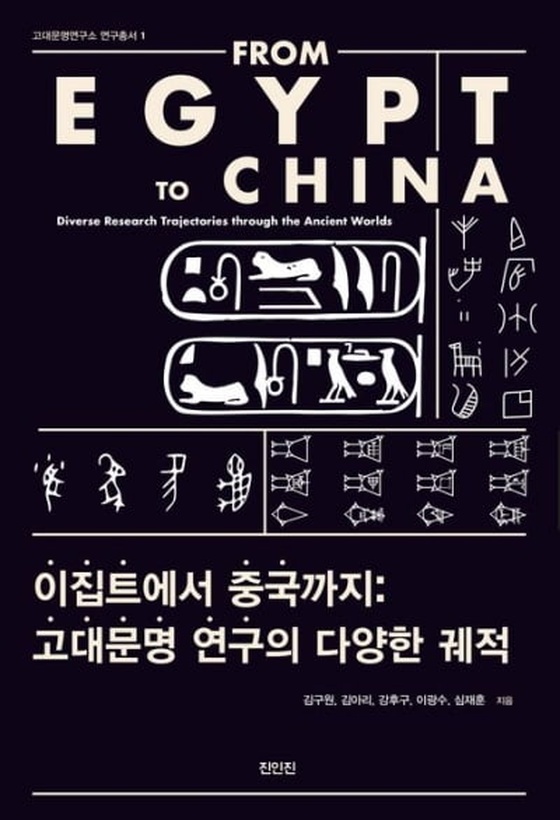[사설] 무역업체들까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한 까닭
밖을 돌아보면 서비스산업은 내수를 벗어나 오히려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치사슬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융·복합 수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서비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분야로 키우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면 한국 서비스산업은 국내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60% 벽을 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국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사업서비스, 여행, 지식재산권 등의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다. ‘서비스업=내수’라는 고정관념이 낳은 규제와 보호정책 등의 결과물임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무역업체들은 고정관념만 깨면 한국 서비스산업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 제조업이 수출로 활로를 찾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서비스산업이라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간다면 수출구조 고도화, 내수 확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체된 내수만을 생각하면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겠지만, 수출로 시장을 키워 나눌 파이가 커지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보건의료 영리화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법 통과를 마냥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길을 터주면 무역업체들이 세계로 나가 경쟁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둥그런 식탁, 심포지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29524.3.jpg)
![[시론] '제조업 강국' 유지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702098.3.jpg)
![[천자칼럼] 라면 대장주 경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01639.3.jpg)